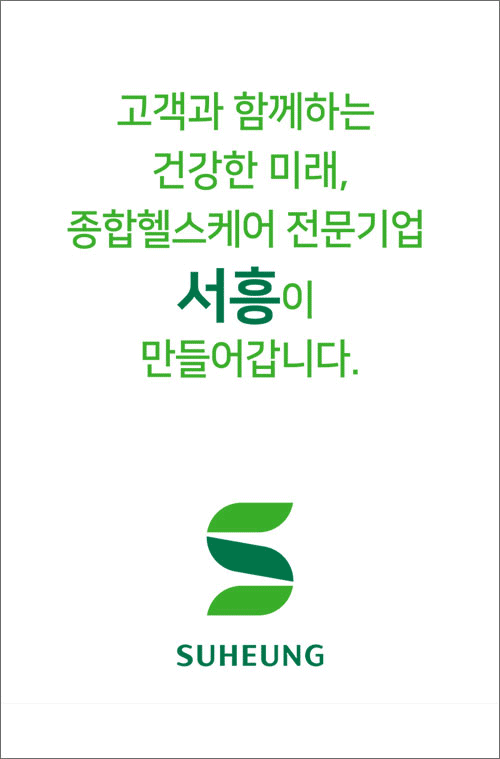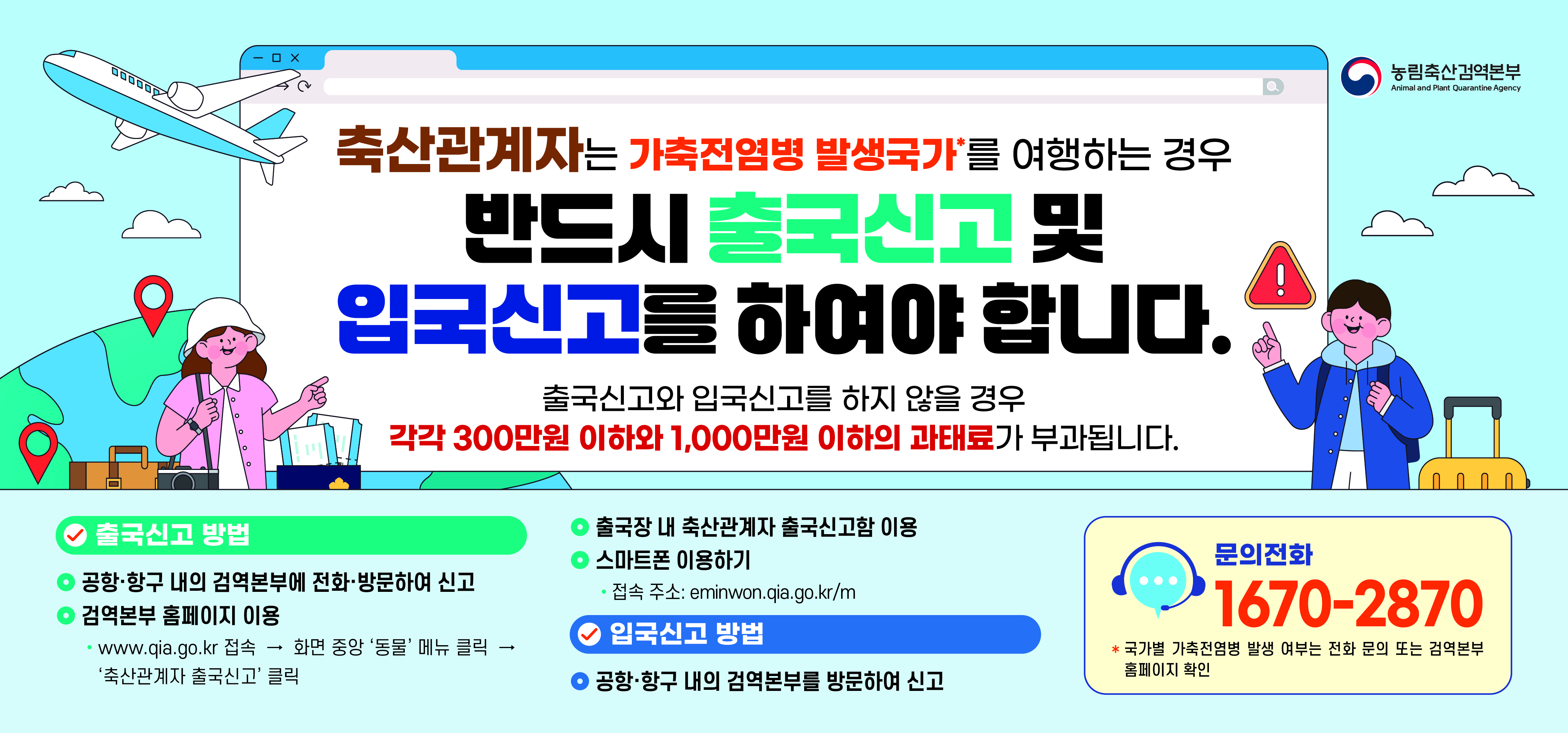필자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할머니와 함께 십리 길을 걸어 오일장에 가곤했다. 장(場)에 갈 때는 보따리 속에 부추며, 깻잎이며 농사를 지은 채소를 시골 사람들의 정(情)만큼이나 꽉꽉 채워 넣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땀 흘려 수확한 것들을 팔아야 그나마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서는 장은 빼 먹을 수 없었다.
필자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할머니와 함께 십리 길을 걸어 오일장에 가곤했다. 장(場)에 갈 때는 보따리 속에 부추며, 깻잎이며 농사를 지은 채소를 시골 사람들의 정(情)만큼이나 꽉꽉 채워 넣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땀 흘려 수확한 것들을 팔아야 그나마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서는 장은 빼 먹을 수 없었다.
어린 나이에 할머니를 쫄래쫄래 따라 그 먼 길을 걸어 시장에 갔던 이유는 따로 있었다. 당시에 시장에 가면 다른 곳에서는 먹을 수 없었던 간이 천막에서 파는 시장표 짜장면, 새끼 손가락만한 조그만 소시지가 들어간 핫도그를 먹을 수 있었다. 물론 먹을 게 다는 아니었다. 평소에는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물건들, 우리 동네에서는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농산물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얼마 전 여행을 하다가 유명 가수가 부른 유행가 노래 속에 등장하는 시장을 들러봤다. 어릴 때 추억을 떠올리며 들뜬 마음으로 시장에 들어섰지만 실망이 아닐 수 없었다. 필자가 살던 곳보다 더 깊은 시골이었음에도 상업화로 인해 옛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외형은 전혀 시장 같지 않았고 장사가 될 만한 획일화된 물건들만 팔고 있었다. 오히려 시장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시장 밖에서 줄지어 자릴 잡고 있는 할머니들의 바구니 안에 있는 야채가 더 다양하고 이목을 끌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가도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을 일부러 찾는다. 장날에 맞춰 여행 일정을 잡는 것도 다반사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관광지로 육성해 성공한 경우도 적지 않다. 외형은 비록 현대화 했지만 다양한 먹거리와 특산물 등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과 눈길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많은 전통시장에 여전히 남아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정감 넘치는 시골 장이 이러한 문제는 도외시한 채 이익만 남기려고 상업화에만 열을 올린다면 소비자나 관광객의 발길은 뜸해질 것이다.
먼저 요즘에는 전통시장에 가 봐도 수입산 농수산물이나 공산품이 상당 부분을 치지하고 있다. 물론 우리 농수산물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남아도는 우리 농수산물 보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수입 농수산물이 전통시장을 점령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장을 농어민들의 직거래장터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도 오히려 이것을 더 원하지 않을까?
다음으로 가격이 다른 곳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것도 찾는 사람들의 낮을 찌푸리게 만든다. 시장을 둘러보다 가격을 보고 포기하고 인근에 있는 마트를 찾아가 더 싸고 편하게 사는 경우도 허다하다. 시장에서 살 때 덤으로 좀 더 받아도 정이라기 생각하기 보다는 가격에 전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해버린다. 획일화된 상품일수록 대부분 다른 곳에서 사다가 파는 것이다 보니 더더욱 그렇다.
획일화된 상품도 문제다. 장사가 된다 싶으면 그 품목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장터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게다가 그 지역과는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 약재와 같은 상품, 그것도 수입산이 판치고 있다면 그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많은 관광객이 전통시장을 찾는 것은 어디서나 다 살 수 있고, 어디서나 흔히 먹을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다. 시장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라도 품목과 먹거리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상인연합회가 협의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다.
시장을 전통이 살아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정이 넘치는 옛 추억의 장터로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아니면 볼 수 없는 물건과 콘텐츠를 확보해야 한다. 시장에서만 묻어나는 ‘덤’을 회복시켜야 한다. 물건만 더 주는 게 덤이 아니다. 그 시장에 가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이 덤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