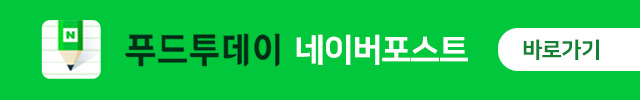얼마 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해 안으로 고향세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2019년에는 고향세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국무총리까지 나서 추진 계획을 밝혔으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고향세 관련 법안 처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해 안으로 고향세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2019년에는 고향세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국무총리까지 나서 추진 계획을 밝혔으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고향세 관련 법안 처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향세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마치 고향을 위해서 납부하는 세금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고향을 위한 자발적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우리가 말하는 고향세는 일본에서 쓰는 고향세란 용어를 그대로 차용해 쓰고 있는 것으로 바람직하지도 않을뿐더러 정확한 의미라고 할 수도 없다. 분명 일본에서도 세금개념은 아니다. ‘고향 기부금’ 정도의 용어로 부르는 것이 맞다.
필자는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할 때 고향세법안을 추진해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직접 성안한 바 있다.
당시에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 등에 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 대한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기는 했지만 기부금법의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기부금품법 개정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국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라고 함) 소관 법률안을 만들면 법안 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도입이 용이하리라 생각해 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국무총리가 고향세 도입 추진을 밝히기 전까지도 제정안은 전체회의에서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긴 게 전부였다. 제대로 된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고향세법과 관련된 법안은 위 제정법안 외에도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계획을 밝히기 전이라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 내년쯤에는 충분히 시행에 들어갔을 것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추진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논의된 것은 박근혜 정부이지만 당시 정부에서는 고향세 도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상황은 그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는데 당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행정자치부 공무원들은 대체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 관료주의의 씁쓸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
고향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효과가 가장 직접적이고, 두 번째 효과는 부수적이기는 하지만 농어업인에게는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직접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세 번째 효과는 지양되어야 할 효과다.
첫 번째 효과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처럼 고향세가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고향세는 농어촌에 소재한 자치단체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효과는 농수산물 소비를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향세를 일찍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 고향세를 내면 답례품으로 지역의 특산물을 보내주고 있다. 물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답례품으로 인해 문제점이 지적되고는 있지만 답례품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농어촌의 농수산물 소비를 증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상 과다한 답례품을 줄 형편도 못되겠지만 답례품을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특히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고향세가 필요한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이고, 농어촌의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지역의 생산물인 농수산물을 보내주는 게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농수산물은 고향세를 내는 사람에게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석이조가 될 수 있다.
셋째, 고향세는 고향 방문이나 관광 등을 통해 사람이 돌아오는 고향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고향세를 내는 사람은 단순히 고향세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향을 방문하거나 고향으로 휴가를 가는 등의 방법으로 고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고향세의 가장 큰 효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 정권에서 고향세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고 기대하는 바도 크지만 제도를 도입할 때 관료주의 폐해로 인해 제도의 도입 취지가 왜곡되거나 행정편의주의로 흘러서는 안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히 입법 효율성만 따지지 말고 제정법안을 만드는 게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