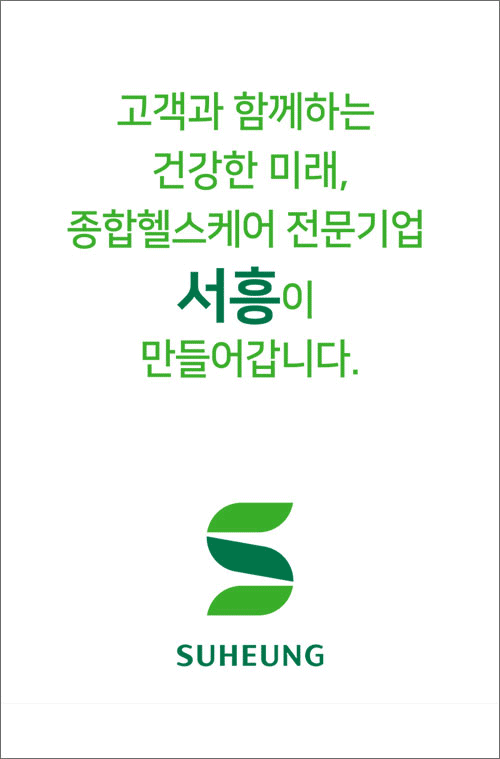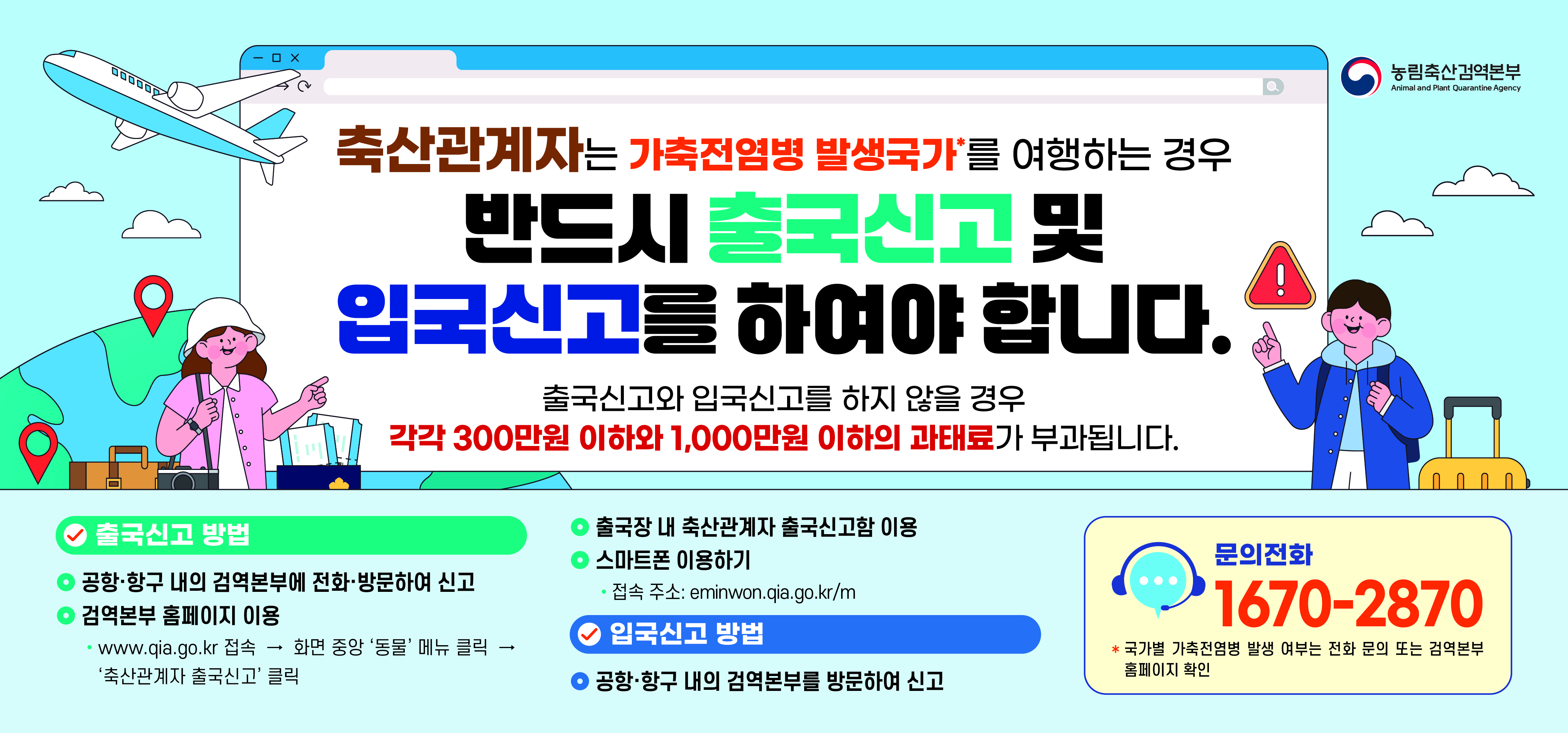1초에 34병이 팔린다. 눕혀 놓으면 지구를 73바퀴나 돌 수 있는 개수다. 국민 한 사람이 800병 넘게 샀다. 세상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있다. 바로 1971년에 선보인 ‘야쿠르트’다.
대한민국 발효 업계의 대표주자인 한국야쿠르트(대표 양기락)가 올해로 창립 41주년을 맞았다.
한국야쿠르트는 1969년 5월 10일 ‘건강사회 건설’이라는 창업이념을 내걸고 발효유 전문기업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설립 초기 조그만 ‘야쿠르트’를 시작으로 ‘메치니코프’, ‘윌’, ‘쿠퍼스’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발효유 시장의 기능성 시대를 열었다.
1983년에 라면사업에 뛰어들었고, 1995년에는 음료시장에 진출하며 종합식품 기업의 기반을 갖췄다. 2008년에는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국가고객만족도(NCSI) 11년 연속 1위라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한국야쿠르트는 창립 초기에는 일반 국민들의 발효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서 많은 에피소드를 양산했다. ‘균을 어떻게 돈을 주고 사먹느냐’, ‘병균을 팔아 먹는다’ 등 유산균을 둘러싼 각종 말들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한국야쿠르트는 이 같은 발효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다양한 샘플링과 무료시음회 등 공격적인 마케팅 공세를 계속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야쿠르트는 출시 이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하루 평균 판매량이 1977년 8월 100만병을 돌파했다. 1983년 6월엔 300만병, 1989년 5월 500만병, 1994년 4월엔 800만병을 돌파했다. 현재는 하루 평균 250만병(연매출 1200억원)이 팔리고 있다.
윌·쿠퍼스 등 멀티 히트상품 줄줄이
라면·음료 이어 건식시장 평정 야심
“좋은 아침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른 아침, 각 가정과 직장에 친근한 웃음을 전하는 노란 옷의 야쿠르트 아줌마.
사람들은 한국야쿠르트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야쿠르트 배달아줌마다. 전국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는 베이지색 유니폼의 야쿠르트아줌마는 1971년 47명으로 활동을 시작해 현재는 전국적으로 1만3500명으로 늘었다.
기혼 여성들은 사회·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던 시기에 한국야쿠르트의 주부 인력 활용은 획기적인 인력 채용 제도였다. 한국야쿠르트 주부 판매원 제도는 기혼 여성들의 사회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 놓았다.
90년 중반, 일부에서는 60∼70년대 한국의 주부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신선한 제품을 고객의 집으로 직접 배달한다는 원칙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회사설립 초기와 달리 대형매장, 대형슈퍼 등의 냉동보관 시설이 크게 발전했고, 경제발전으로 주부들의 일자리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IMF 사태가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때 한국야쿠르트는 오히려 방문판매 조직을 확대하면서 더 많은 주부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했다.
‘불황 때는 방문판매’라는 속설이 맞아 떨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IMF사태는 스킨십 마케팅의 대표주자인 한국야쿠르트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세상은 변한다. 보험아줌마는 생활설계사로 바뀌고, 아줌마들도 ‘미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한다. 하지만 한국야쿠르트가 4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야쿠르트 아줌마’를 고집하는 것은 ‘그 이름 안에 회사가 들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신소재 분야로 연구개발 확대
한국야쿠르트는 국내 유산균 발효유 시장의 42%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했다. ‘야쿠르트’ 외에도 1980년대부터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수많은 히트 상품을 만들어 왔다.
대표적인 히트 상품으로는 ‘야쿠르트’ ‘메치니코프’ ‘윌’ ‘쿠퍼스’ 등의 발효유 제품을 비롯해 ‘왕뚜껑’ ‘팔도 비빔면’ 등 라면 제품과 음료 제품 ‘비락식혜’, 커피 음료 ‘산타페’, 유기농 야채즙 ‘하루야채’ 등이 있다.
지난 2000년 선보인 ‘윌’은 현재 하루 70만 개, 연간 2억 개 이상이 판매되면서 식품 업계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2004년 9월 출시한 간 기능 활성화 발효유 ‘쿠퍼스’ 역시 하루 평균 18만 개 이상 판매되면서 유산균 발효유의 영역을 한층 더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제품 모두 임상시험을 거쳐 인정받은 제품력을 바탕으로 발효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쿠퍼스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심사해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GH(Good Health) 마크를 획득,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품질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판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우수제품인증(GH)을 받기 위한 개발과 투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2005년 7월 출시한 유기농 야채즙 ‘하루야채’는 아줌마 판매 시스템을 십분 활용해 2007년 연매출 600억 원을 기록하는 등 야채즙 시장의 돌풍을 주도하고 있다.
2008년 1월 신설된 건강기능식품연구팀의 연구개발을 통해 최근 선보인 천연원료 비타민브랜드 Vfood 역시 출시 1개월 만에 매출 40억원을 돌파하고 올해 3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R&BD(산업화기반기술개발) 부문에는 기획팀 외에 총 7개의 연구 전담팀, 80여명의 전문가들이 유산균을 중심으로 신소재부문까지 연구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또 유산균을 이용한 프로바이오틱스의 개발과 유전공학을 접목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 실천
한국야쿠르트는 ‘건강사회건설’이라는 창업이념 아래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야쿠르트의 ‘나눔경영’의 중심에는 지난 1975년 조직돼 33년간 활동해오고 있는 사내 봉사단체 ‘사랑의 손길펴기회’가 있다. ‘열 숟가락 밥을 모으면 한 그릇이 된다’는 십시일반의 정신을 기본으로 한다.
사원들은 입사와 동시에 이 ‘사랑의 손길펴기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며 매월 급여의 1%를 봉사활동 기금으로 활용한다.
현재까지 이 단체의 도움을 받은 곳은 2000여곳에 이르고, 그동안의 지원금액을 따지면 무려 230억원이 넘는다.
전국 단위조직별로 편성된 총 26개 위원회가 활동하며 각 위원회별로 월 1회 이상의 봉사활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매년 테마를 선정해 활동을 집중함으로써 봉사효과를 극대화했다.
올해의 테마는 ‘소외된 아동 보호’다. 고아원생,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생활 여건에 놓인 아이들과 장애인보호센터의 지체장애아를 대상으로 사랑의 손길을 펴는데 특히 집중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3년째 농촌봉사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이 외에도 ‘야쿠르트 아줌마’와 전 임직원이 함께 하는 봉사활동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한번으로 끝나는 이벤트성 봉사가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 아래 매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업계 최대규모 고객센터 운영
한국야쿠르트는 ‘함께하는 활력사회’라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고객중심의 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다.
고객 가치의 극대화가 기업 가치 극대화의 근본이라는 신념 아래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목표를 ‘고객가치 경영추구’로 정하고 고객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고객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다양한 리서치 활동 전개, 주부모니터 활용, 고객들을 위한 공장견학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해 고객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고객참여 마케팅을 통해 고객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 중심의 제품개발로 상품가치의 극대화를 꾀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으로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소비자불만자율관리프로그램(CCMS)을 도입해 고객위주로의 경영 패러다임을 확고히 했다. 이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소비자 불만처리가 가능케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지난해 9월에는 식품업계 최대 규모인 고객센터를 개설했다. 새로 개설된 고객센터는 기존 고객만족팀 외에 별도로 구축한 신규조직으로 식품업계 최대 규모인 16명의 인원으로 운영된다.
고객센터는 기존의 고객응대기능을 넘어서 상담 및 거래정보를 기반으로 한 고객니즈를 찾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발굴된 니즈는 신제품 개발, 이벤트 진행, 고객 혜택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고객가치창출로 가공된다.
이와 더불어 회사 홈페이지도 새로 단장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처럼 한국 야쿠르트는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성장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는 모습이다. 이쯤 되니 ‘성장이 한국야쿠르트의 기업문화’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정말 한국야쿠르트의 성장은 끝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