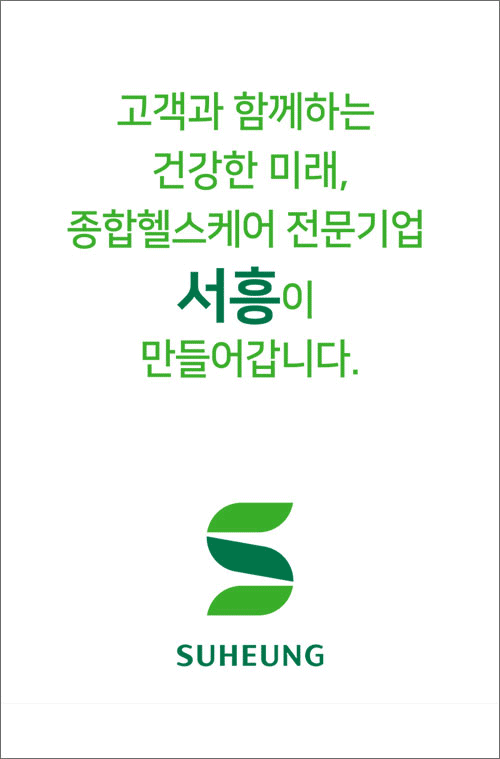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세 곳 중 한 곳꼴로 거짓으로 성적서를 발급하거나 부실검사를 했다는 실상이 드러나면서 식품 당국의 부실한 식품안전관리가 또다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적발된 기관 중에는 공익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국립대 소속 연구소와 정부 출연연구기관도 들어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위생검사기관이 `불량'…대체 누구를 믿나 = 식약청에 따르면 특별점검 결과, 국내 식품위생검사기관 61곳 가운데 8곳은 하지도 않은 시험을 했다면서 가짜 성적서를 발급했다. 13곳은 법에 정해진 검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식품검사 기관의 3분의 1이 실정법을 어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식품 당국의 부실한 관리 책임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만든 식품을 검사해 안전을 검증해 주는 식품위생검사기관 부실 관리 사실에 충격을 넘어 분노를 토로하는 목소리마저 소비자한테서 나오고 있다.
그 칼끝은 실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사실상 내버려둔 식약청으로 향하고 있다.
사실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부실한 검사 관행 문제가 이번에 처음 터진 게 아니다.
지난 2007년에도 식품위생검사기관 40%가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 규정을 위반해 적발됐었다. 당시 식약청은 이들 규정 위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을 뿐이다. 똑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는 토양을 식약청 스스로 제공한 격이다.
특히 식약청은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개선 지시를 받고도 뒷짐만 지고 있었던 셈이어서 이래저래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뒷북 대책…"실효성 있을까" = 식약청은 사태가 번지고 나서야 뒤늦게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식품 당국은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 나서 3년이 지나면 반드시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지정일몰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허위 성적서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검사기관 지정 취소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시험검사기관 임직원은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도 새로 만들어 강화했다. 식약청은 이런 대책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사능력관리규정'을 개정해 검사능력 현장평가제를 도입하고 검사기관이 시행한 검사가 정확한지 무작위 표본조사를 거쳐 확인하는 '시험검사 검증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시험기관 간 과당 경쟁이 부실검사를 부른다는 지적에 따라 식약청이 정한 최저가 이하로는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검사수수료 원가산출 신고제'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기관의 인력과 검사 수주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 관리 프로파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험검사 평가관을 양성해 운영하는 한편 우수시험검사기관 운영제도와 검사결과 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검사기관의 질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런 식약청의 '뒷북 행정'에 대해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직장인 A(40. 서울 종로구 구기동)씨는 "식품 당국이 관리부실로 부적합 식품이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도록 내버려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