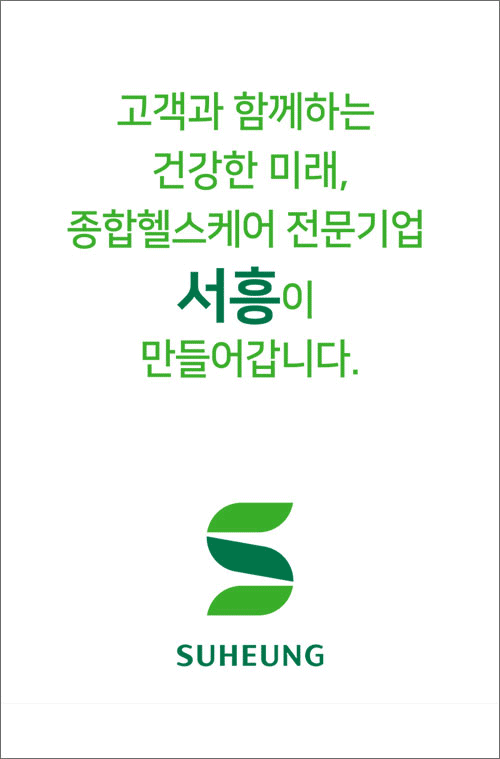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스타벅스의 정신적 지주 하워드 슐츠는 알고 있을까? 고객 경험을 중시하는 본인의 철학으로 인해 불편함과 불쾌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줄 서신거 맞으세요?”, “여기가 줄인가요?”
“89번 고객님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큰 목소리로)89번 고객님. (더 큰 목소리로)89번 고객님. (더욱 더 큰 목소리로)89번 고객님”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주문하다 보면 늘 이런일이 생긴다. 주문한 커피를 받을 때는 또 어떤가. 내가 주문한 커피가 언제 나올지 몰라 카운터 주변을 맴돌아야 한다. 그렇게 주문하려는 사람과 음료를 받으려는 사람이 뒤엉켜서 북새통을 이룬다.
직장인이 몰리는 점심 시간때나 수요가 많은 매장을 찾으면 카운터 주변은 더욱 혼잡스럽다. 여기에 음료를 찾아가라는 스타벅스 직원들의 외침까지 더해지면 이건 뭐 도떼기 시장이 따로 없다. 목에 핏줄을 세우며 주문번호를 반복하는 직원을 보면 이건 고객과의 스킨쉽이 아니라 화를 안내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다.
스타벅스에서 이런 상황 한번쯤은 마주쳤을 것이다.
왜 스타벅스에는 '키오스크'와 '진동벨'이 없을까. 이는 고객과 눈을 맞추며 감성적으로 소통하는 하워드 슐츠 최고경영자(CEO)의 경영 철학이 깔려 있다. 하워드 슐츠 회장의 경영철학은 인간중심 경영으로, 고객에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고객의 감동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진동벨을 이용해 기계적으로 음료를 주는 것이 아닌 음료를 기다리는 고객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
그렇데 현실은 어떤가. 여러분은 스타벅스에서 직원과 어떤 대화를 나눠 보셨나요? 공식처럼 주고 받는 주문 멘트 이상의 대화를 짧게라도 주고 받은 적이 있나요?
직원들은 고객의 주문번호를 수십번을 목청껏 불러야 하고, 고객 감동을 주기 위한 눈맞춤은 꿈도 못 꾼다. 호명 후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음료를 찾아가는 시스템이 됐다. 오히려 "이거 제 음료 맞나요?"라고 묻고, 직원은 답해야 하고 오히려 일을 더 만드는 꼴이다.
어제도, 엊그제도 찾았던 스타벅스 직원들의 표정은 웃음끼 없는 표정과 건조한 말투로 주문을 받고 음료를 내주었다. 직원의 컨디션이 좋아야 고객을 보고 한번이라도 더 웃을텐데, 고강도 노동에 지친 스타벅스 직원에게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 가끔은 불편함을 넘어 불쾌감도 느껴진다.
일반적 상황 속에서의 불편만이라면 괜찮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19일 스타벅스코리아에 청각.언어장애인이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할 때 화상 수어 서비스나 키오스크 등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스타벅스는 인권위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차량·시설물 접촉 사고가 있을 수 있고, 키오스크 이용을 위해 차에서 내리면 교통안전 위험도 동반된다며 키오스크 방식의 편의 제공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렇다 우리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청각.언어장애인이 매장이나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할 때 키오스크와 진동벨이 없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다.
스타벅스의 고객 호명 시스템은 하워드 슐츠 회장이 이탈리아 밀라노 출장 도중 방문한 소규모 에스프레소 바에서 받았던 감동으로부터 시작됐다. 커피 제국을 이룩하기 전 출발은 그랬을지 몰라도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적 커피 전문으로 성장한 스타벅스가 소규모 기업 식의 행동 방식이 맞는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새로운 커피 문화의 확산 그리고 고객과 직원이 함께 행복해지는 공간으로 기획된 하워드슐츠의 스타벅스. 지금의 스타벅스는 그런 공간일까?
극히 일부 매장이지만 기존의 철학을 깨고 스타벅스의 시작한 진동벨 서비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