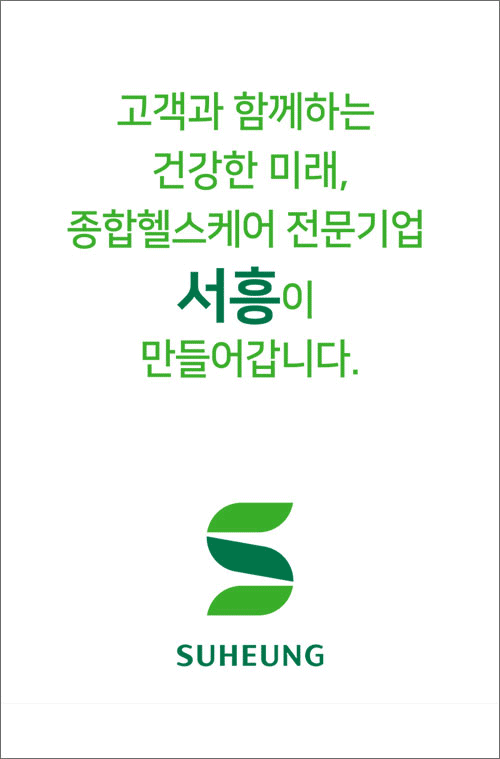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 이전에 비해 와인이 대중화되면서 점차 와인 소비량이 늘고 있다. 더구나 와인은 선물용이나 이벤트용으로도 많이 쓰여 ‘와인’ 자체에 대한 의미는 단순히 마시는 ‘술’ 이상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프랑스산, 칠레산, 미국산 와인 할 것 없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자기만의 것’을 원하고, 좀더 특별하고 의미있는 와인을 원하는 사람도 늘었다. 홈메이드 와인의 저변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는 다음 와인동호회(cafe.daum.net/winemania) 정재민(38. 유학원 운영)씨를 만나봤다. - 홈메이드 와인은 언제 처음 접했나. 10여년 전 캐나다 유학생활 중 교수님 집에 초대받은 적이 있었다. 다소 촌스러운 레이블의 와인이었다. 근데 이 와인을 교수님이 직접 담그신 거라고 했다. 설마 하고 의심하는 나를 데리고 교수님이 댁에 있는 지하실엘 갔는데, 거기에 와인을 만드는 작업실이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마음에 도구와 재료를 |
- 와인만들기 동호회를 조직하게 된 계기는.
한국으로 돌아와 와인을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도구와 재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와인을 개인이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손에 꼽힐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캐나다에서 필요한 것들을 수입해 담그기 시작했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내가 만든 와인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저변확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작년 10월 처음 동호회를 조직할 때만해도 48명의 회원으로 시작된 것이 벌써 3천400여명으로 늘었다. 일주일 단위로 보면 매주 1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할 정도로 회원수에 관해서는 허수가 적다.
와인문화가 많이 형성되긴 했지만 여전히 와인은 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와인하면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마시는 것부터 어려우니 그럴 법도 하다.
와인 마시는 법에 관해 ‘누가 만들었나’를 따지고 보면 실상 이는 계급적 성격을 띄고 있는 듯 하다. 초기에 외국에서 와인을 마셔본 사람이 국내에 보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대중성을 막았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특권층의 전유물인 것처럼.
혹시 처음 와인을 맛볼 때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는가. 처음 와인을 접했을 때 떫고 신맛이 좀 낯설게 느껴졌었다. 내 생각에 와인의 맛은 우리에게 익숙한 직감적인 맛이라기보다는 학습에 의해 길들여진 맛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것 때문에 와인의 대중화가 더뎠던 것으로 생각된다.
- 그래도 와인하면 만들기 어렵게 느껴지는데.
흔히들 마시는 것도 까다로운 와인을 만드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냥 라면 끓이는 것과 그다지 다를 것도 없다. 캐나다 시절 양조용 주스를 사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효모만 넣으면 될 정도의 쉬운 과정을 통해 포도주를 만들었다.
혹시 ‘누가 만든 포도주’ 하며 고급품종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 포도주는 주로 지역이나 만들어진 연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만큼 포도주를 결정하는 요건은 품종, 즉 재료라고 할 수 있다. 담그는 사람의 영향력은 한 10~20% 정도 일 것이다.
- 홈메이드 와인이 가진 매력은 무엇인가.
최고의 와인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수입된 중저가의 와인에 버금가는 정도는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중에 2~3만원에 유통되는 와인이 있다고 하자. 그 정도의 와인은 현지가로 2~3천원에 불과하다.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와인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와인을 만드는 것 자체에 즐거움과 의미가 있다. 내 손으로 와인의 맛을 낸다는 즐거움에 와인병과 레이블까지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는가. 와인을 만들며 창조의 즐거움을 맛본다.
박연수 기자/1004@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