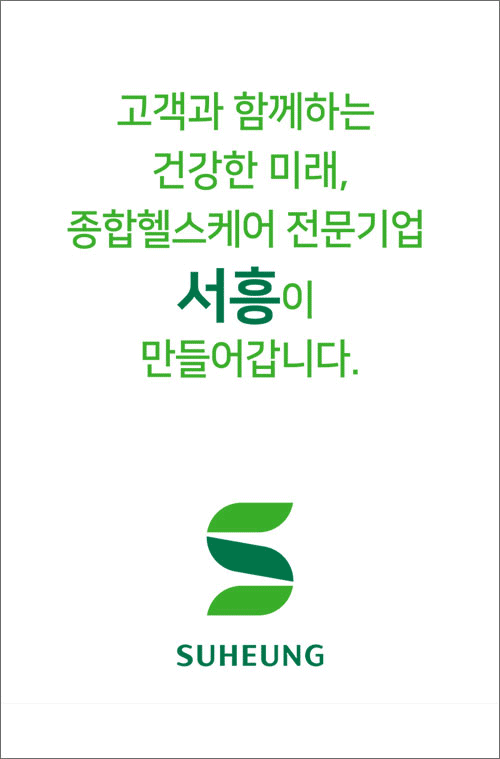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 30년 역사의 전통 장류 전문 중소기업인 해찬들과 국내 최대의 식품 대기업인 CJ주식회사의 전략적 제휴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4년 전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50대50의 지분으로 합작 경영을 해왔으나 기존의 구주주들이 CJ측이 당초의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며 CJ측이 가진 50%의 지분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CJ와 해찬들의 전략적 제휴관계는 국내 식품업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케이스로서 업계의 주목과 기대를 모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기대는 결국 양 사에 상처만 남겼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의 길이 멀어지는 느낌이어서 씁쓸하다. 4년전 CJ와 해찬들은 합작경영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
CJ로서는 제휴 이전에도 장류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미미한 상태에서 경쟁사인 (주)대상의 독주를 견제할 필요를 느꼈을 테고, 해찬들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대기업인 대상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벅차다는 생각을 가질만했기에 서로가 ‘러브콜’을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좁은 국내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기보다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자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 사가 파경에 이르게 된 원인이 뭘까. 해찬들의 구주주측이 내세운 이유는 경업(競業)금지 의무 위반 등 계약내용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회사 관계자들이 말하는 속사정은 따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경영권과 경영방식을 둘러싼 분쟁이 요체라는 것이다. 해찬들 구주주측은 CJ가 경영은 기존 주주들에게 맡기겠다고 해놓고 일일이 간섭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CJ측은 경영방식과 관행이 개인기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회사발전을 위한 조치이지 경영간섭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해찬들은 실제로 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지분구성에 따라 양측이 동수의 이사진에 의해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필자는 기업가들의 잘못된 마인드를 지적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나만이 잘할 수 있고, 꼭 내가 해야 한다는 식의 마인드를 버리라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업과 기업관계에서도 상대를 존중해줄 때만이 상생이 가능한 것이다. 상대의 단점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장점을 인정하고 존중해줄 때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CJ측에서는 해찬들이 개인기업으로서 갖고 있는 재래식 경영방식을 문제 삼고 이를 한꺼번에 지나치게 개선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무리수다. 30년 동안 한복을 입어 온 사람에게 갑자기 양복으로 갈아입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CJ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3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해찬들의 기술력과 제조 노하우이지 경영방식은 아니었을 것이다. 해찬들이 갖고 있는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살리면서 CJ가 갖고 있는 마케팅력과 브랜드파워를 활용해 상호 시너지를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해찬들의 구주주측도 잘못이 있긴 마찬가지다. CJ측이 경영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다소 지나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경영간섭으로 인식한 자체가 잘못이다. 구주주측이 갖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대기업과 제휴를 했다면 대기업이 가진 장점을 인정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열린 마음을 가졌어야 했다.
우리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성장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이유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주들이 끝까지 자본과 경영, 기술력까지도 자기만의 것으로 독차지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록 내 것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남에게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동업은 형제와도 하지 마라’는 말이 생각났다. 이 말은 남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이제 우리 기업사회에도 재래식 개념의 ‘동업’이 아니라 잘할 수 있는 분야만 맡아서 하는 ‘분업’ 또는 ‘협업’의 개념이 형성될 때가 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