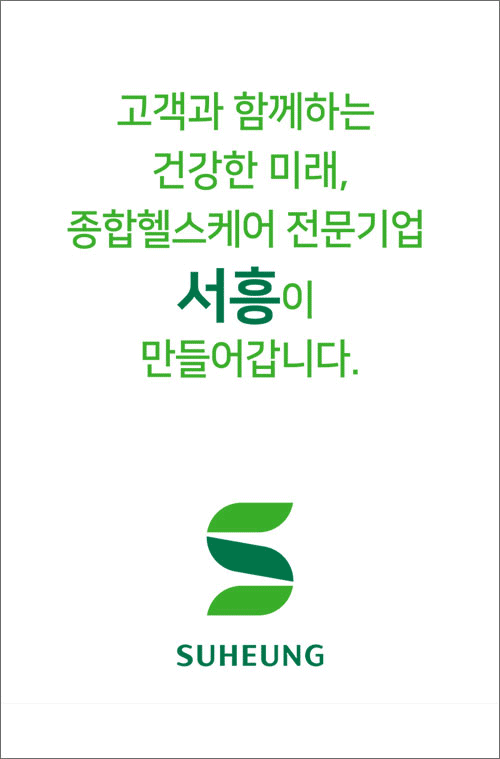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 마감은 임박해 오는데, 펜은 당최 나갈 줄 모르고 상사와 선배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져만 간다. 온통 담배연기만 자욱한 사무실에 갇혀 모두들 신경이 곤두서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폭발할 지경이다. 연실 뻑뻑 피워대던 담배가 물릴 지경이 되서야 마감은 대충 끝이 난다. “정말, 못해 먹겠다” 마감을 막 끝낸 기자들의 모습은 흡사 소금에 푹 쩔은 고등어와 같다. 마감 날의 술 한잔은 이미 습관적인 것이다. 기자들의 특징은 앉았다하면 전투하듯 거의 결사적으로 마셔대는 것이다. |
금새 술잔이 흔들리고 기둥도 휘청거린다.
마감날 못해먹겠다며 머리를 쥐어뜯던 동료는 소주 몇 잔에 온 세상이 제 것인냥 떠들고, 기사 내놓으라며 목 조르던 호랑이 선배는 마냥 실없이 웃고 있는 중이다. 지친 오늘은 이렇게 소주와 함께 삼켜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에이, 입맛 쓰려 더는 못 먹겠다~ 커억~”
새벽이 가까이 닿으면 해장국으로 마무리를 한다. 해장국 중에는 펄펄 끓어오르는 맑은 국물에 아작아작 씹히는 콩나물이 기가 막힌 콩나물해장국이 단연 으뜸이다. 콩나물 해장국은 국물이 기름지지 않고 시원해 술에 찌든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데 그만이다.
전주 욕쟁이 할머니의 삼백집(사장 박송자·62)이 서울로 상경했다는 소문을 뒤늦게 듣고 냉큼 달려나왔다. 전주에서 올라온 지 이제 3년이 되었는데 유명세 때문인지 점심시간이면 줄을 서서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 ‘아무리 그래도 콩나물해장국이 맛있어 봤자 얼마나 맛있겠어’ 라는 편견은 삼백집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콩나물해장국이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콩나물인데, 삼백집의 콩나물은 모두 전주에서 직접 배달된다. 여느 음식집이 같은 조리방법으로 끓이는데도 삼백집 콩나물해장국이 뭔가 다른 것은 바로 이 전주표 콩나물 때문이다. 콩나물뿐만 아니라, 고춧가루도 강원도에서 직접 냄새맡아보고 만져본 것을 써야한다. 파, 마늘 등 모든 농산물도 신토불이여야 하고 또 그 중 가장 좋은 것들이어야 한다. 삼백집 해장국이 유별나게 맛좋다는 소리를 듣는 것에는 옛날식 국간장에 절인 장조림에도 비결이 숨어있다. 절인 장조림을 결대로 찢어 끓는 국물에 넣고 조리하면 아삭아삭 씹히는 콩나물과 입안에서 기막힌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다. “그래도 맛은 정성이죠” 하루에 백단위로 나가는 해장국을 모두 박 사장은 직접 조리한다. 그래야 정성이 더 깊이 베이고 한결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사장의 고집이다. 바글바글 끓는 국물 가운데 올라있는 계란노른자는 너무 흐트리지 말고 살짝 휘휘 저어 반숙이 되게 익힌다. 간은 새우젓으로 하고 썰은 고추도 한 수저 넣는다. 밥과 콩나물을 작은 사라에 덜어 후후 불어 먹는데, 적당히 식은 밥을 김에 싸먹으면 또 하나의 별식이 된다. 물론 시원한 해장국을 먹을 때는 단단히 여문 청양고추를 먹어줘야 한다. |
기자는 똑똑해야 해 먹는 줄 알았다. 하지만 막상 경험하고 보니 기자란 단순한 사람이 제격이란 생각이다. 힘든 마감은 소주 한잔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소주 한잔에 쓰린 속은 시원한 해장국 한그릇에 감쪽같이 잊는다. 선배의 잔소리에 짜증스러움이 밀려오던 중, 삼백집 콩나물해장국 생각이 스치며 금새 행복해 진다.
아, 기자가 천직이구나.
(541-6667)
구인영 기자/her@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