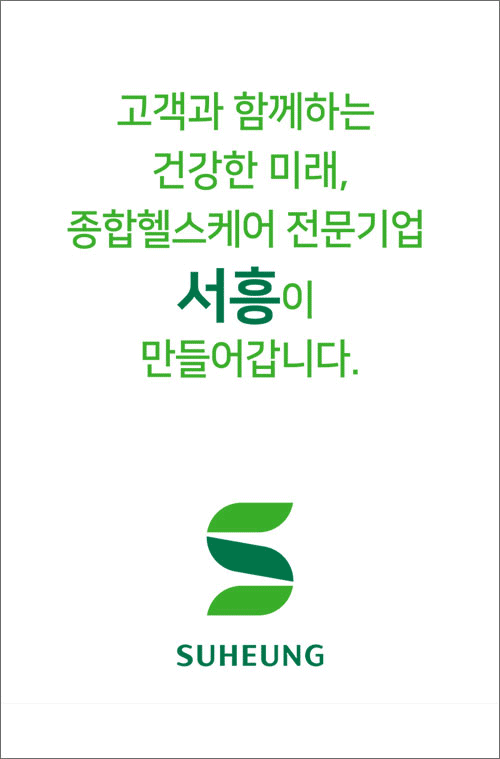뚝배기 한그릇에 넘쳐나는 시원하고 구수한 맛과 ‘인심’
‘도닥도닥’
오늘도 어머니의 도마질 소리에 잠을 깬다.
고질병인 허리병 탓에 밤새 뒤척이셨을 텐데, 어머니는 어김없이 이른 새벽에 일어나 계셨다.
아, 시계를 보니 이제 막 6시가 넘었다. 된장찌개 끓는 구수한 냄새는 이미 온 집안에 퍼져 있었다. 반쯤 감은 눈을 부비적 거리며 방문을 여는 어린 딸을 보고 어머니는 부랴부랴 앞치마에 손을 훔친다. 어린 딸을 어서 끌어안고 등을 한번 쓸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새 한 상이 차려졌다. 상에 오르고도 한참을 끓는 된장찌개는 바쁜 아침시간에도 모두를 모여 앉게 한다. 아버지는 싱겁다고 어머니를 탓하시고, 어머니는 짠 음식은 건강에 해롭다며 반박하신다. 두 분 사이에 일상적인 실랑이가 오고간다. 딸은 그 사이에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흐믓해 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늦장을 부리는 날이면 어머니는 밥에 된장찌개를 비벼다가 딸의 꽁무니를 쫓기 시작한다. 버릇 나빠진다는 아버지의 타박도 개의치 않은 모양으로 어머니는 된장 비빈 밥 한 숟가락을 딸의 입안에 넣어 주기에 바쁘다.
어머니의 된장찌개는 얼마나 구수했던가, 세상에서 그때만큼 달고 향기로웠던 아침식사를 기자는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느새 된장찌개란 직장 내 한끼를 때우기 위해 재빨리 먹고 툭툭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하는 음식이 되었다. 또 저녁시간 삼겹살에 소주 한잔 기울일 때 몇 숟가락 뜨고 내버려지는 음식이 되었다.
문득 ‘내 어머니’의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진다.
된장찌개란 백 명이 끓이면 백가지 맛이 나는 음식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의 된장찌개 맛을 찾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또 내가 어머니의 된장찌개를 그리워하는 것은 사실 된장찌개를 끓이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리운 입맛과 마음을 위로해 줄만한 집을 찾았다.
영등포에 위치한 ‘부일갈비’
이름 그대로 ‘고깃집’이다. 하지만 여타의 고깃집이 저녁에 북적이는 것과는 달리 이 집은 외려 낮 손님이 더욱 많은 지경이다. 보기만 해도 배부른 이 집만의 해물된장찌개 탓이다.
 | 매일 장에서 손수 고른 신선한 해물을 깨끗이 손질한다. 계절에 관계없이 십 여가지 이상의 해물을 준비하고 손질하기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우렁은 소금을 뿌려 문지른 다음 깨끗이 헹궈낸다. 모시조개는 소금물에서 해감을 토하게 한다. 게는 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네 등분하고 오징어는 깨끗이 씻어 칼집을 내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육수와 끓인다. 된장은 조금 적은 듯 풀고 나머지 간은 국물이 한소끔 더 끓인 뒤 소금으로 맞춘다. 꽃게, 새우, 홍합, 소라, 오징어, 미더덕, 모시조개 등 뚝배기가 푸짐하다. 된장의 구수한 맛, 해 |
‘아 시원하다’는 감탄사가 제 스스로도 모르게 연발된다. 무말랭이 고춧잎 무침, 시원한 소박이, 간간한 젓갈, 홍어회 무침, 게장, 으깬 감자 요리 등 한 상 그득 나온 정갈한 반찬도 정성이 그대로 묻어난다. 그날의 반찬은 모두 그날 아침에 만든다. 메뉴도 김치 외에 매일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노릿하게 구워져 나오는 갈치와 꽁치 등의 생선구이는 특별 서비스. 이 한 상이 어떻게 6천원으로 해결될까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부부는 쓸 돈이 조금 생겼다 싶으면 더 좋은 고기와 식재를 사야 한다.
정성을 다한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그만이다. 돈 벌겠다는 생각은 일찌감치 버린 사람들이다.
해물된장찌개 자랑만 늘어놓은 것은 오로지 기자의 취향 때문이다. 이 집만의 달콤한 양념소스가 그만인 양념갈비는 아이들에게 인기 최고의 메뉴이고 생갈비는 육질이 부드러워 어르신네들이 즐겨 찾는다. 질 좋은 한우만 고집한다는 이 집은 맛뿐만 아니라 넉넉한 고기 인심으로도 유명하다.
부일갈비의 해물된장찌개는 내 어머니의 된장찌개 맛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하지만 후덕하고 사람 좋은 이 집 부부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새벽녘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어린 딸을 끌어안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아, 배도 부르고 마음도 부르다.
전화 2636-9462
구인영 기자/her@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