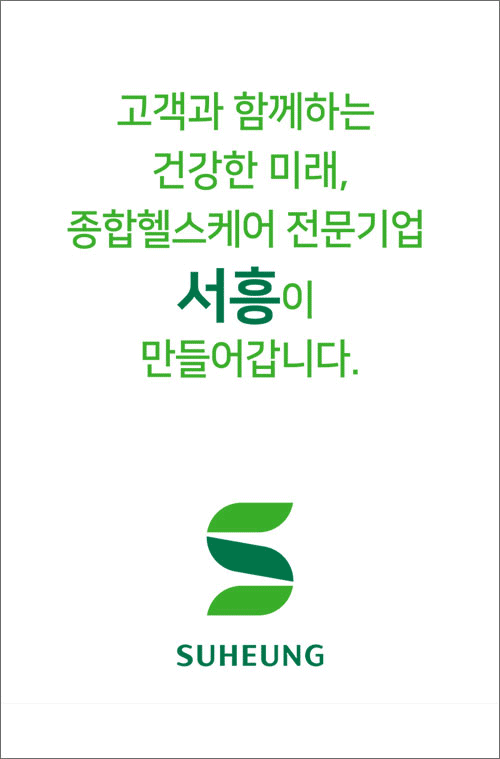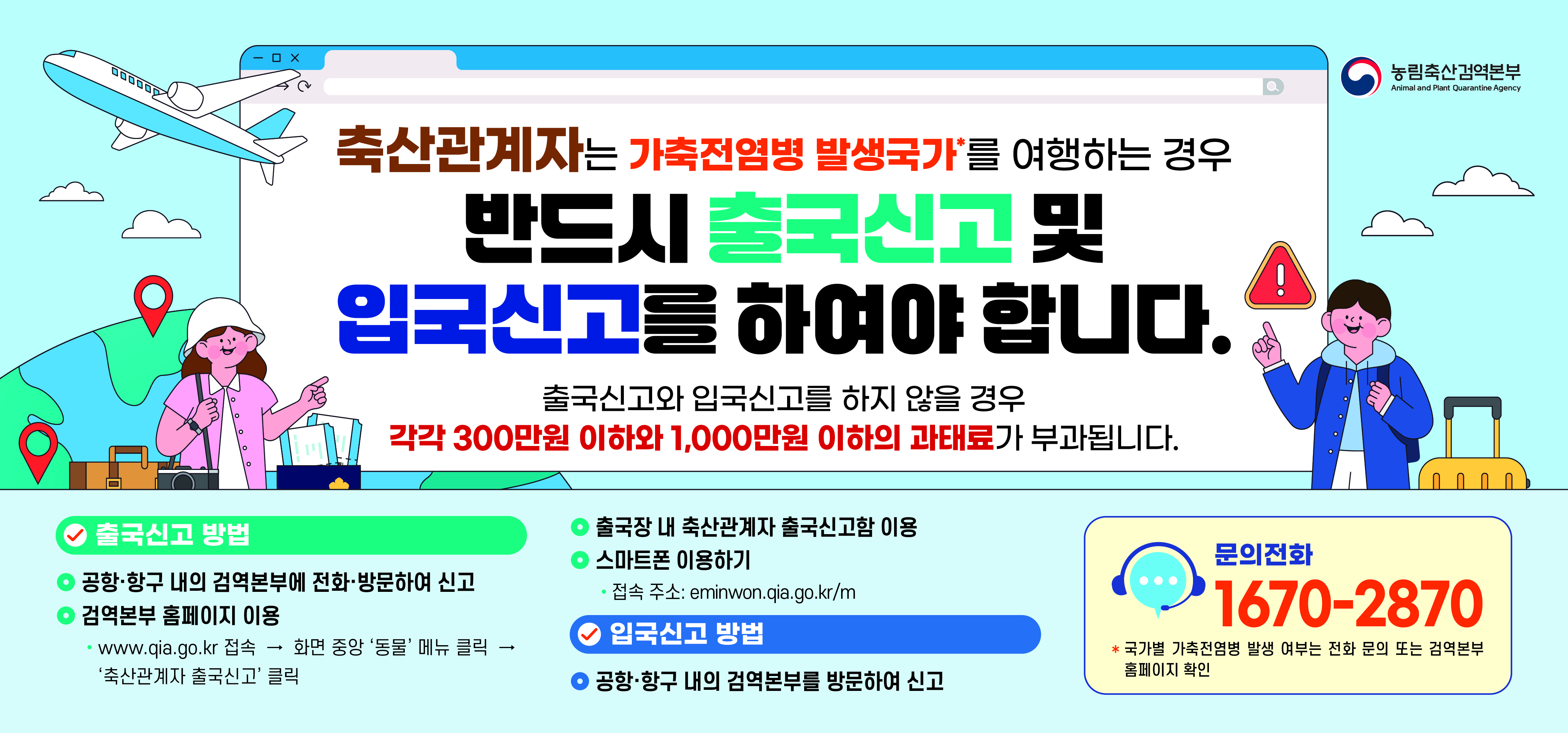식약청 "경쟁력 제고 위해 지원 우선 할터"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가 넘어오면서 기나긴 '술의 전쟁'에 종지부가 찍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달부터 국세청을 대신해 식품위생법이나 위생 관계 법령에 따른 주류의 위생 및 주류 함유물질의 유해성 여부 등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하게 된다.
식품안전은 대부분 식품안전 전문기관인 식약청이 전담해 왔으나 주류 안전에 대해서만은 지난 1948년 정부수립 후 줄곧 국세청이 업무를 수행해왔다. 세원관리와 주질 관리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를 이관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존 입장이었다.
업무이관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두 기관은 주질 검사를 병행 실시하기도 했지만 2006년 이후 양 기관 간 업무소관 불분명, 업무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국세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결국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는 식약청으로 넘어 왔고, 그 판단은 주류 수출입 규모와 주류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요소 등이 증가하는 주류시장의 상황을 감안할 때 세입징수기관인 국세청이 안전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전문기관인 식약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가 식약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앞으로 국세청의 업무는 ▷주류제조방법 ▷알코올 도수·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 ▷표시사항 등 주세법에서 정한 세원 및 면허관리와 그에 따른 분석업무에만 한정된다.
반면 식약청의 경우 식품위생법이나 위생 관계 법령에 따른 주류의 위생 및 주류 함유물질의 유해성 여부 등 주류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해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주 산업 위축 우려
그러나 이번 안전관리 업무의 식약청 이관에 대해 불안한 시선을 보내는 곳이 있다. 바로 주류업계다. 안전관리 업무의 식약청 이관으로 인해 주류산업이 위축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이처럼 주류업계가 불안한 눈길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안명옥 전의원이 국세청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식약청 유통주류 수거검사 실적(2004년-2007년6월)'과 '주류행정관련 업무분장'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류의 '단속'과 '행정처분 권한'에 대한 두 기관의 ‘차이’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자료를 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식약청 주류 수거단속결과 적발된 국내 업소 23곳을 국세청에 통보했지만 국세청에 보고된 식약청 통보건수는 18건으로 나타났고, 더욱이 18건 중 3곳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류 단속에 따른 부적합 비율을 비교해보아도 국세청과 식약청의 실적이 차이가 났다.
국세청 수거검사 실적은 급감(2006년 1046건 → 2007년 6월 178건)했지만, 식약청 수거검사 건수는 매년 증가세(2004년 308건 → 2005년 510건 → 2006년 680건)를 보였었다.
연도별 부적합율을 보면, 국세청은 2004년 16.2%(66건)에서 2005년 14.1%(143건), 2006년 6.9%(72건), 2007년 6월 6.7%(12건)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식약청이 검사한 것 중 부적합비율은 2004년 2%(6건), 2005년 2%(10건), 2006년 1.2%(8건), 2007년 6월 5%(18건)로서 부적합비율이 높아졌다.
이 같은 사실만 보아도 주류업계의 걱정은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걱정이 많은 곳은 막걸리 제조업체다.
현재 막걸리는 주세법과 식품위생법 등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막걸리는 소주나 맥주에 비해 위생에 있어서 다른 식품에 비해 관리 기준이 매우 미흡한 상태다.
실제 일반식품의 경우 원료의 원산지 표시나 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는 것과는 달리 막걸리는 원재료의 원산지는 물론 첨가물에 대한 표기도 의무화 돼 있지 않다.
막걸리에 사용되는 주재료인 쌀 문제가 최근 대두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막걸리에 사용되는 쌀이 대부분 중국산 또는 미국산임에도 이에 대한 표기가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막걸리에 아스파탐이나 합성착향료를 사용해도 이를 표기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평소 마시는 막걸리에 어떤 재료가 사용되는지 알 길이 없다.
이밖에 주류의 종류,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단속’보다 ‘지원’에 무게
그러나 일반 식품의 경우 검출되면 안 되는 성분 또는 검출 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 것과는 달리 막걸리는 이에 대한 특별한 기준도 없는 상태다.
게다가 병맥주나 소주는 시중에 유통되기 전 생산되는 과정에서 멸균 과정을 거치는 반면 막걸리는 제품 안에서 계속 발효되고 있으며 발효를 위해 병뚜껑에 숨구멍을 내 외부 환경에 의한 오염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때문에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가 이관된다면 단속 강화에 따라 행정적 처분이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업체들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업체들의 우려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주류는 규제가 필요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막걸리 등 전통주의 경우 경쟁력 있는 문화·수출상품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만큼 단속보다는 위생관리 측면에서의 지원을 우선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식품이물 관리와 식품의 첨가물 등 국제표준화에 경험이 있는 식약청이 막걸리 안전관리를 맡게 되면 이는 전체 국산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역할을 할 것”이라며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의 식약청 이관이 막걸리 업계에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막걸리 수출액은 총 627만7000 달러로 전년도보다 41.9% 증가란 수치다. 10년 전인 1999년(70만5000달러)에 비해 9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부분 역시 단속 보다는 식약청이 ‘지원’ 위주로 업무를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을 가능케 한다.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같은 위생시설 보완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도 식약청에서는 “의무적용이 아니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식약청의 방침은 ‘단속’보다는 ‘지원’에 무게를 더 두고 주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