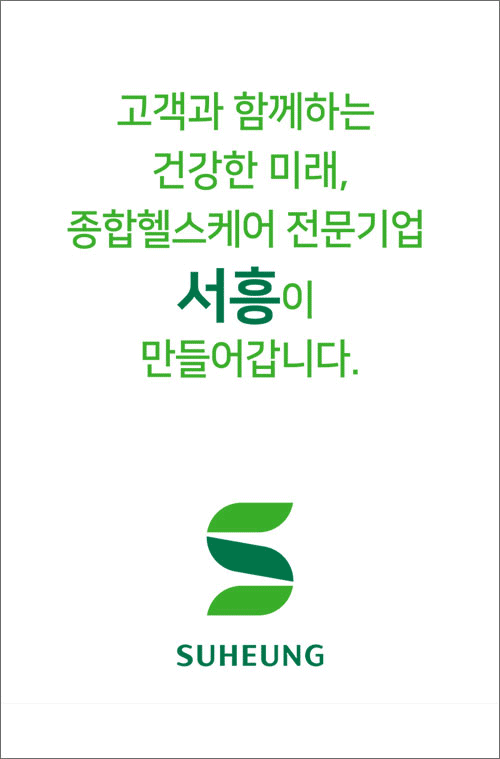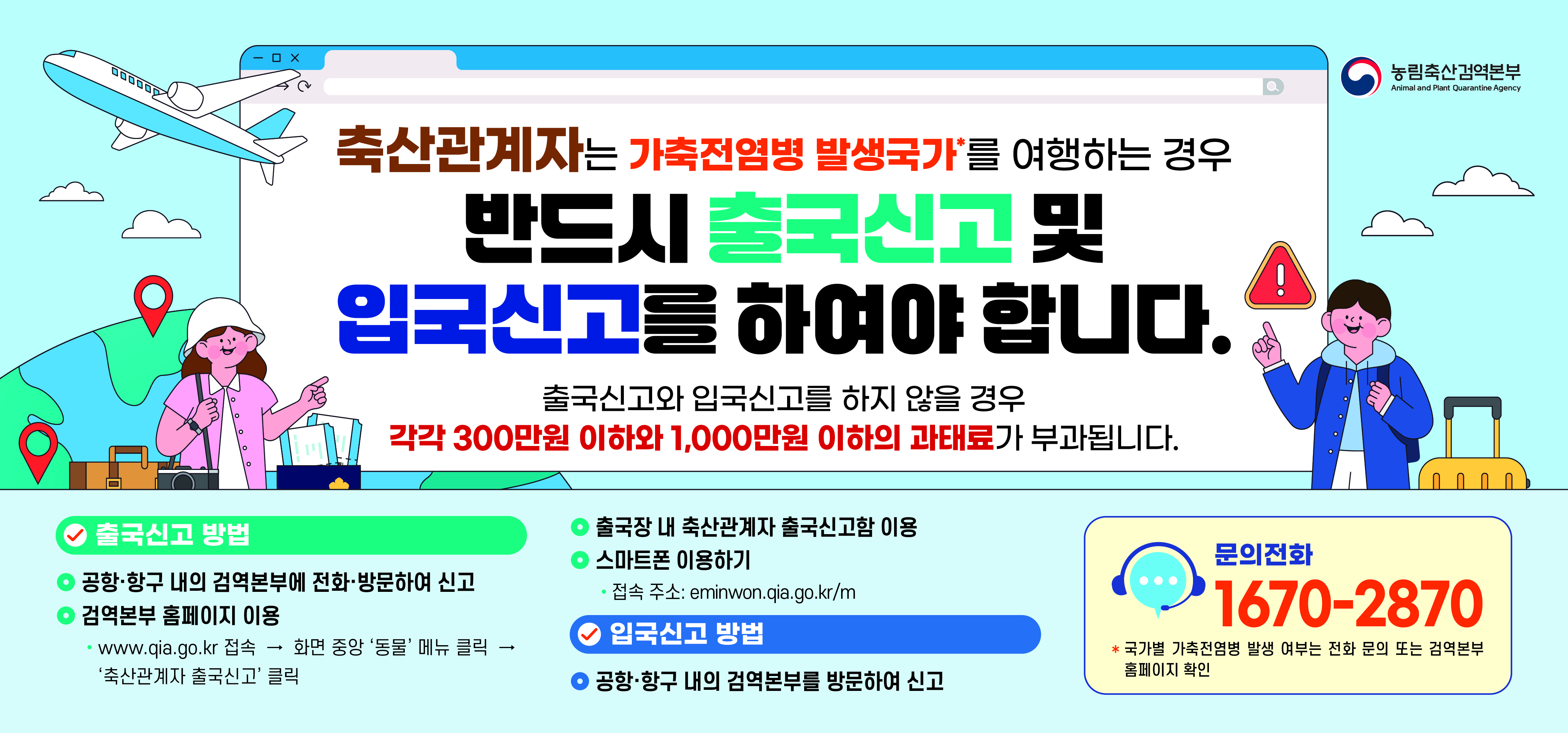[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9년, 달걀 껍데기에 숫자가 새겨지기 시작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정부는 계란 생산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난각표시제’를 도입했다. 달걀마다 산란일과 사육환경이 표시되며 소비자는 그 숫자를 통해 계란의 신선도와 생산방식을 추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제도는 여전히 여러 물음표에 직면해 있다. 불투명 케이스나 온라인 구매 시 소비자는 난각번호를 확인하기 어렵고, 고병원성 AI 특수 방역기간에는 자연방사 자체가 금지되며 ‘1번’ 계란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다. 농가 현장에서는 ‘사육환경 번호’가 실제 위생이나 품질과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연구에서는 자연방사 계란이 더 위생적이지 않다는 결과도 보고됐다.
난각번호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그 알 권리가 얼마나 실질적인지, 그리고 이 숫자가 진짜 ‘믿을 만한 기준’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시점이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이번 기획을 통해 제도 시행 배경과 운영 현실, 농가·소비자·정부의 입장을 조망하며, 난각표시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AI 방역이 부른 표시 제한, 농가는 ‘답답’
2019년 시행된 난각표시제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농장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표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계절마다 반복되는 ‘1번 계란 논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고병원성 AI 방역기간 동안 방사 사육이 금지되면서, 동물복지 인증 농장조차도 ‘1번’ 표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기준과 운영 해석을 놓고 주무 부처 간 엇갈린 입장이 지속되자, 정부는 결국 관련 고시 개정에 나섰다. 혼란을 끝내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이 주목된다.
난각번호 1번은 닭이 ‘방사 사육’되는 환경에서 낳은 달걀에 부여된다. 기존 케이지(0.05㎡/마리)는 4번, 개선된 케이지는 3번, 평사는 2번, 방목은 1번의 사육환경번호가 부여된다.
그러나 매년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10월~이듬해 2월) 동안에는 방사 자체가 금지되며, 1번 계란은 유통될 수 없다. 이로 인해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조차도 이 기간에는 1번 표시를 할 수 없어 마케팅과 유통에 큰 혼란을 겪어왔다.
실제로 동물복지 인증 농장을 운영 중인 한 농가는 “시설도 방사 기준에 맞춰 다 갖춰 놨는데, 계절 때문에 1번이 아닌 2번으로 바꾸라는 건 이해가 안 된다”며 “포장지, 마케팅, 납품처까지 다 바꿔야 해 큰 피해를 본다”고 하소연했다.

식약처 vs 농식품부, 기준 해석 엇갈려...“시설 기준이면 충분" 고시 개정 착수
이 문제는 식약처와 농식품부 간 규정 해석의 엇갈림에서 비롯됐다. 식약처는 ‘실제 방사 여부’를 기준으로 1번 부여를 제한한 반면, 농식품부는 “사육환경이 방사 기준을 충족하면 1번 부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농식품부는 결국 고시 개정에 나섰다. 고시가 개정되면 올해 겨울부터는 방사시설을 갖춘 농가가 특방기간에도 1번 표시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난각번호 1~4번은 본질적으로 사육환경에 대한 기준일 뿐, 겨울철 문을 열고, 닫는다고 해서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식약처와 협의 끝에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며, 올해 특방기간에 방사가 금지 되더라도 1번 계란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 혼선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난각표시제가 소비자 신뢰를 얻기 위해선 제도 일관성과 부처 간 조율, 농가와 소비자 권익의 균형 확보가 필수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