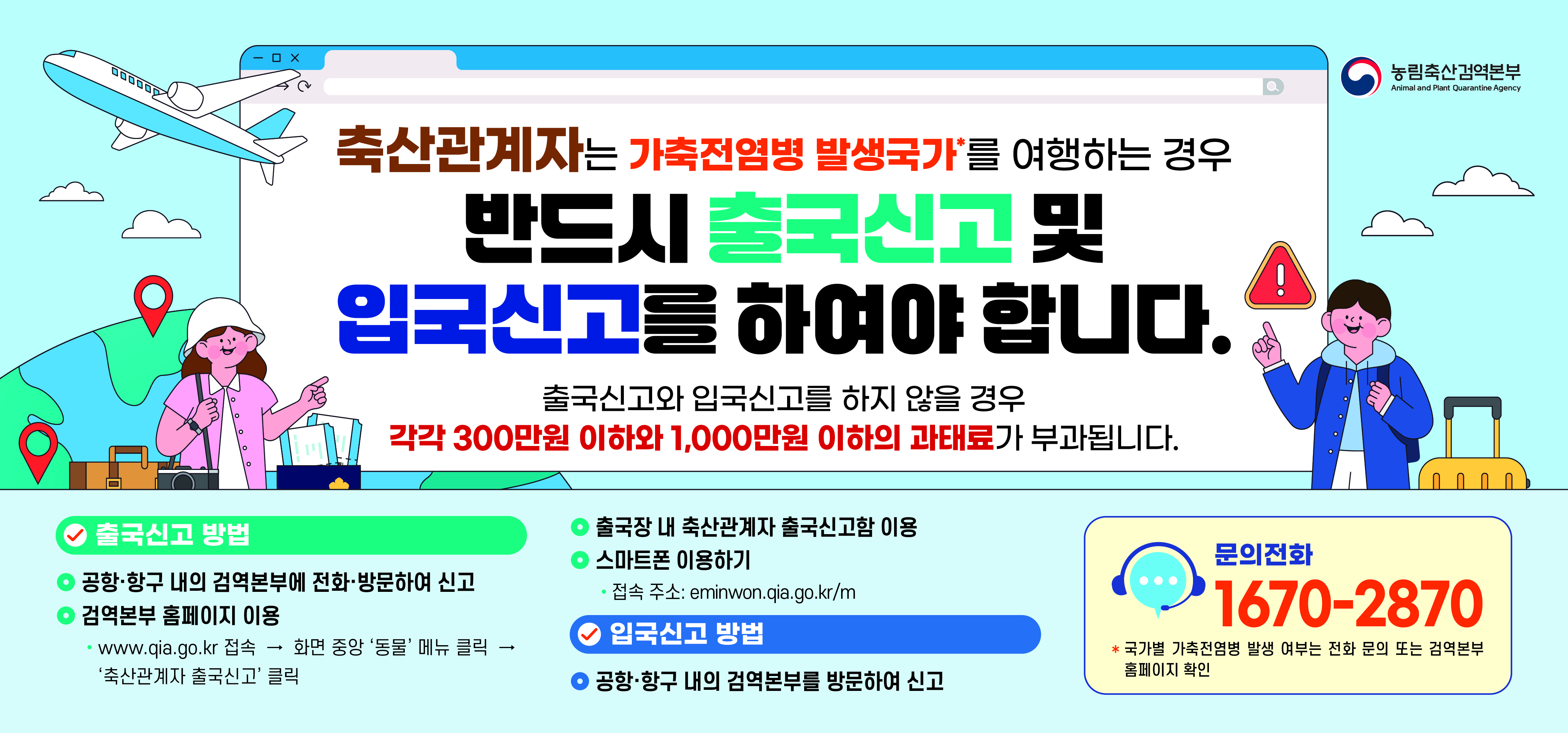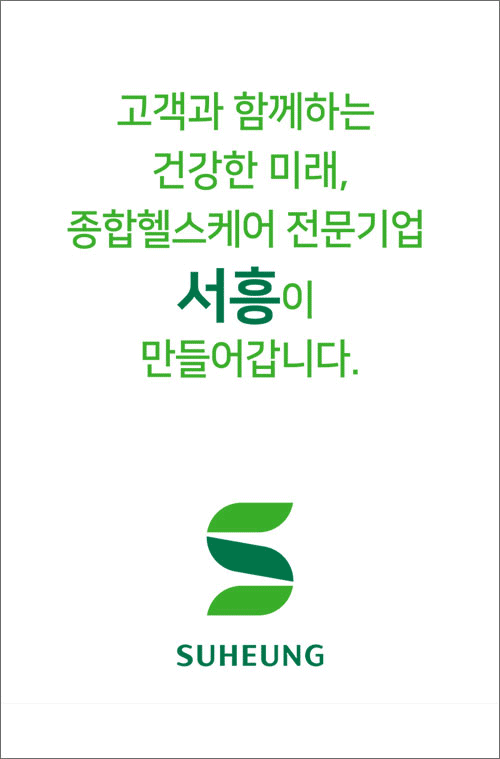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
| △ 김병조 편집국장 |
최근 학교급식의 선진화를 위한 논의가 눈에 띠게 활발해졌다. 각종 토론회에서 학교급식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속출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대부분이 미시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사고를 줄일 것인가, 우리농산물 사용은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운영방식은 직영이 좋은가 위탁이 좋은가, 인적자원 선진화 방안은 뭔가 등의 논의가 바로 그런 것이다.
학교급식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그런 미시적인 내용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에 대한 거시적 접근이 없이는 미시적 과제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학교급식을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학교급식의 수요자가 700만 명이 넘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며, 그들이 12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제공받는 서비스라는 점에서다.
학교급식은 곧 국민건강권 보호와 직결된다는 의미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학교급식이 농업 농촌의 사활은 물론 식량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이다. 1만 개에 이르는 학교급식 현장에서 우리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가 농업 농촌의 소득과 연계가 되고 이는 나아가 식량안보의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을 단지 하루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학교급식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갖고 백년대계 차원에서 정책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때문에 학교급식문제를 교육 차원으로만 보는 것도 잘못된 시각이다.
국민건강 차원에서 보면 보건복지부와 관련이 있고, 급식재료의 사용 차원에서 보면 농림부와 직결되고, 또 음식은 곧 그 나라의 문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문화관광부도 관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관한 정책은 범정부적으로 세워야 한다.
왜 학교급식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정부가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해 119조 투융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는 학교에 예산지원을 해준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농업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농촌에 아무리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시켜봤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학교에서는 우리농산물을 사용함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농업 농촌은 수요가 늘어나서 소득이 보장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학교급식과 관련해 또 한 가지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사항은 식육(食育)이다. 어른들이 ‘밥이 보약이다’ 또는 ‘된장, 김치가 몸에 좋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조차 왜 그런지 과학적인 설명을 해줄 능력이 없다. 학교 현장에서 우리의 전통식품이 왜 좋은지,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왜 나쁜지에 대해 아이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과학적 근거에 의해 체계적인 교육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이미 서구화 되어 있는 아이들의 식습관을 전통음식으로 돌려놓을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농산물 사용도 확대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든 그 범주 안에서만 해법을 찾으려고 하면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법이다. 농업 농촌 문제도 그렇고 학교급식 문제도 마찬가지다. 농업 농촌 문제를 농림부 차원에서만 고민을 해봤자 나올 수 있는 해법이라는 것이 뻔하다.
학교급식 역시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하면 획기적인 선진화 방안을 쉽게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학교급식과 농업 농촌문제는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댈 경우 상생의 길을 충분히 찾을 수 있어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학교급식을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한다. 급식행정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당국자나 정치인들이 학교급식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철학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세부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 하면 학교급식에서 식중독 사고를 줄일 것인가, 우리농산물 사용은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운영방식은 직영이 좋은가 위탁이 좋은가, 인적자원 선진화 방안은 뭔가 등의 논의가 바로 그런 것이다.
학교급식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그런 미시적인 내용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에 대한 거시적 접근이 없이는 미시적 과제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학교급식을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학교급식의 수요자가 700만 명이 넘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며, 그들이 12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제공받는 서비스라는 점에서다.
학교급식은 곧 국민건강권 보호와 직결된다는 의미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학교급식이 농업 농촌의 사활은 물론 식량안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이다. 1만 개에 이르는 학교급식 현장에서 우리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가 농업 농촌의 소득과 연계가 되고 이는 나아가 식량안보의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을 단지 하루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학교급식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갖고 백년대계 차원에서 정책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때문에 학교급식문제를 교육 차원으로만 보는 것도 잘못된 시각이다.
국민건강 차원에서 보면 보건복지부와 관련이 있고, 급식재료의 사용 차원에서 보면 농림부와 직결되고, 또 음식은 곧 그 나라의 문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문화관광부도 관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관한 정책은 범정부적으로 세워야 한다.
왜 학교급식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정부가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해 119조 투융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교육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는 학교에 예산지원을 해준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농업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농촌에 아무리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시켜봤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학교에서는 우리농산물을 사용함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고, 농업 농촌은 수요가 늘어나서 소득이 보장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학교급식과 관련해 또 한 가지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사항은 식육(食育)이다. 어른들이 ‘밥이 보약이다’ 또는 ‘된장, 김치가 몸에 좋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조차 왜 그런지 과학적인 설명을 해줄 능력이 없다. 학교 현장에서 우리의 전통식품이 왜 좋은지,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왜 나쁜지에 대해 아이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과학적 근거에 의해 체계적인 교육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만 이미 서구화 되어 있는 아이들의 식습관을 전통음식으로 돌려놓을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농산물 사용도 확대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든 그 범주 안에서만 해법을 찾으려고 하면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법이다. 농업 농촌 문제도 그렇고 학교급식 문제도 마찬가지다. 농업 농촌 문제를 농림부 차원에서만 고민을 해봤자 나올 수 있는 해법이라는 것이 뻔하다.
학교급식 역시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하면 획기적인 선진화 방안을 쉽게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학교급식과 농업 농촌문제는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댈 경우 상생의 길을 충분히 찾을 수 있어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학교급식을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한다. 급식행정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당국자나 정치인들이 학교급식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철학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세부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김병조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