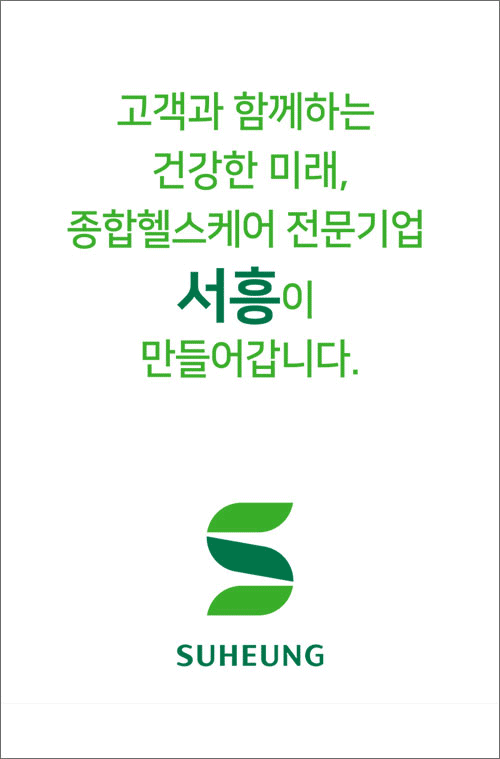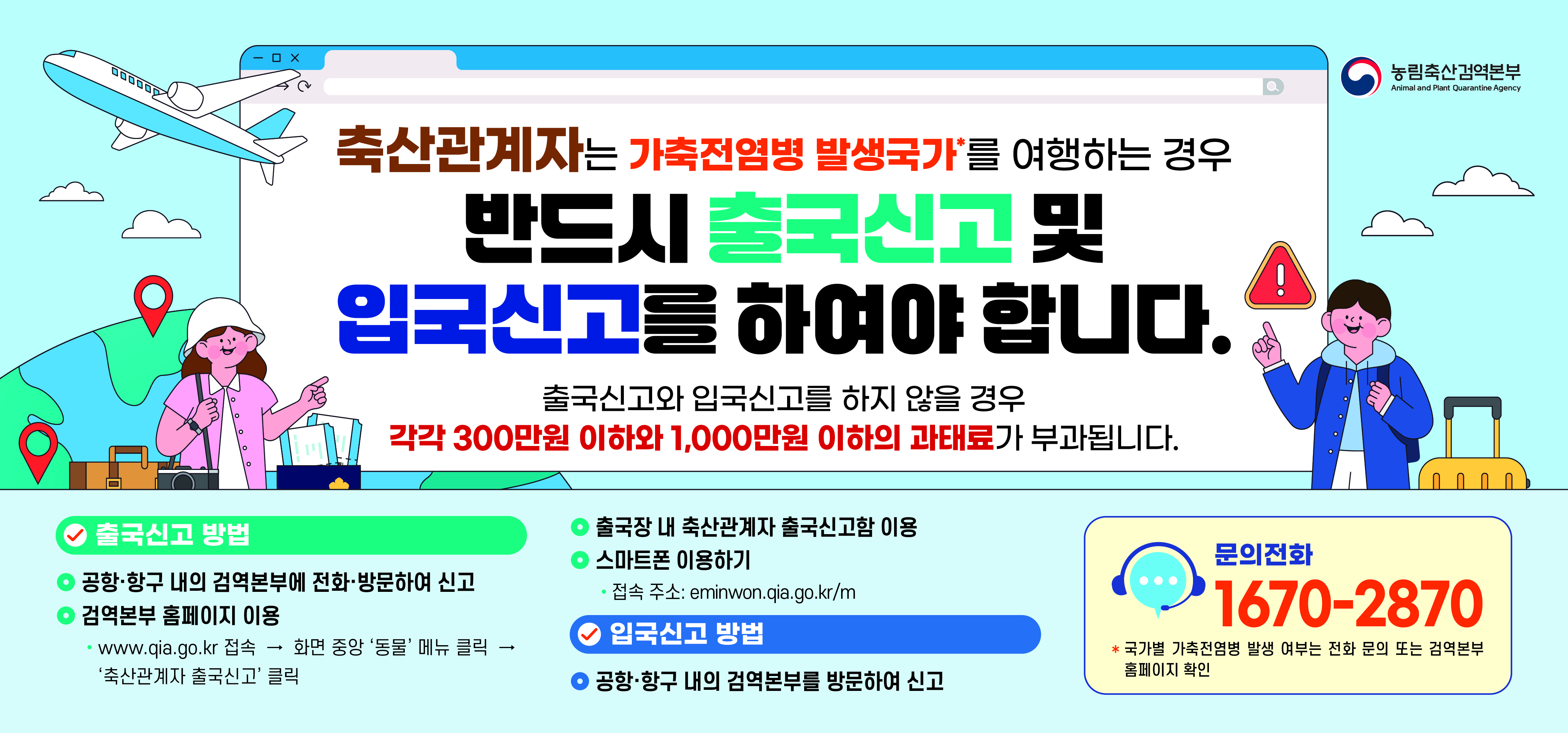[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최초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규모를 추정한 결과, 최소 1만 7,647명에서 최대 3만 1,3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인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를 입수했다.
가정 내에 아픈 가족 외에 성인 가구원이 없어 아동이 주된 돌봄을 맡은 경우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경기 3,906명(22.1%), ▲서울 2519명(14.3%), ▲경북 1329명(7.5%), ▲경남 1275명(7.2%), ▲부산 1145명(6.5%), ▲전남 985명(5.6%), ▲전북 941명(5.3%) 순으로 많았다.
이들 가구의 경제적 상황은 심각했다. 6~12세 가족돌봄아동 가구 중 2021년 근로소득이 있는 비율은 최소 44.46%로, 전체 아동가구(81.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가구소득도 평균 2,218만 원으로 전체 아동 가구(7,909만 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돌봄 사유는 지역별 산업·인구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산업단지가 위치한 경남(9.6%)과 울산(9.1%)은 장해급여 수급 가구가 많았다. 전남(6.7%), 제주(5.6%), 전북(4.7%)은 노인맞춤돌봄 수급 비율이 높았다. 이는 지역 특성에 맞춘 발굴과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조사 결과, 가족돌봄아동들은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일 외에도, 설거지, 청소, 동생 돌보기, 부모 식사 준비, 심지어 농사일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어려움 등 복합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
정부는 2024년 8월부터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나, 13세 미만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올해 2월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이 제정되며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서미화 의원은 “가족돌봄아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인식되지 못해서 제도 밖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병원 등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을 조기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