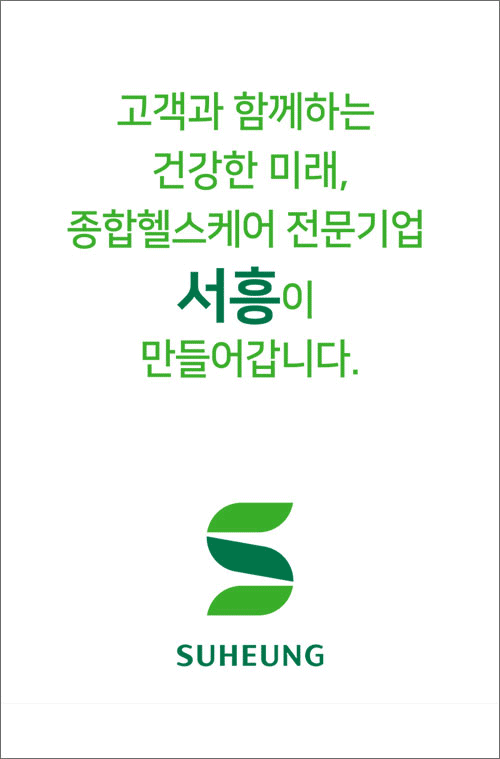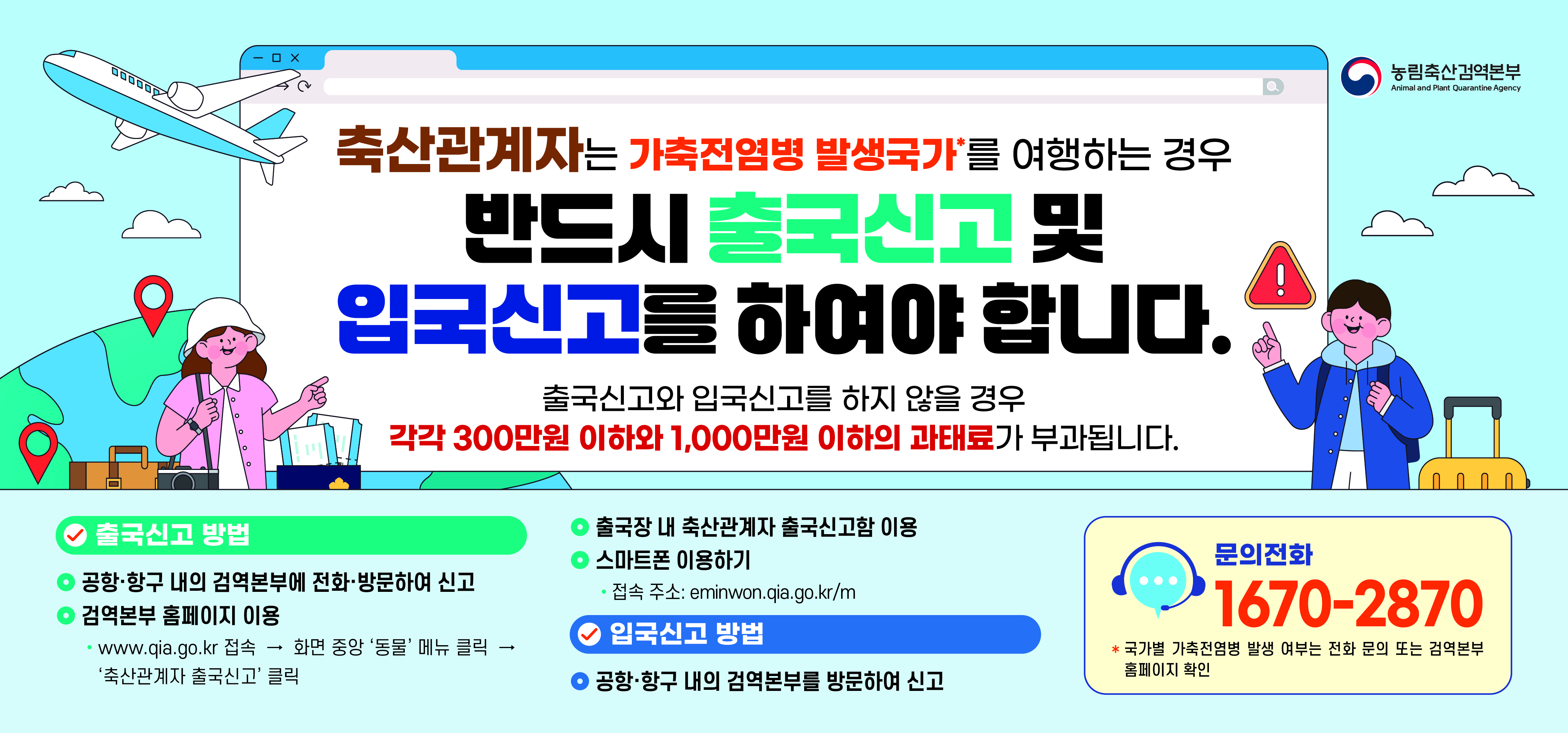"위를 얇게 곱게 벗기고 가운데를 잘 헤치면 맑은 술이 용출하여 개미와 꽃이 잔뜩 뜨고 술내가 향기로워 가히 사랑스럽다"
조선시대 한글판 가정대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규합총서'에 나온 진달래술 빚는 법의 일부다. 술이 다 된 상태를 `개미와 꽃이 잔뜩 떠 있다'고 표현했다.
조선시대 안동 장씨 부인이 한글로 쓴 조리책인 `음식디미방'에도 음식에 모양을 내는 고명을 `교태'로 부르고, `매운 불'(강한 불) `독한 고기'(상한고기), `바둑 두듯 낱낱이 뒤집어'라는 표현도 눈에 띈다.
비빔밥의 원조는 섣달 그믐에 남은 음식들을 다 섞어 함께 나누어 먹는 `섣달 골동반'과 안동 지역에서 제사 음식을 곁들여 비벼 먹는 `헛제삿밥'이고, 미음, 응이, 의이, 원미는 모두 곡물로 만든 죽을 이르는 말이다.
호서대 식품영향학과 정혜경 교수가 쓴 `한국 음식 오디세이'는 말 그대로 우리 전통 음식을 내세워 역사와 생활, 풍습으로 떠나는 여행이다.
누구나 한번쯤 가져봤을 궁금증 하나. `전라도 음식은 화려하고 강원도 음식은 소박하고 토속적이고, 충청도 음식은 꾸밈없고 검소한데 서울 음식의 특색은 뭘까'.
답은 특색 없는 것이 특색이다. 서울 음식은 전국에서 모여든 갖가지 재료를 다양하게 활용해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음식이 발달했다.
자극적인 것을 천하게 여겨 짜지도 맵지도 않고 격식을 따지며 가짓수는 많지만 양은 조금씩, 양념이 드러나지 않아야 하는 등 반가에서는 궁중의 풍습을 따랐으며 신선로, 구절판 등이 대표적인 서울 음식이다.
음식과 관련한 말부터 세시풍속, 역사 그리고 밥과 국, 김치, 나물, 장, 떡 등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담긴 미학까지 두루 섭렵하다가 짬짬이 만드는 법을 소개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또 `약식동원'(藥食同原)이라 하여 음식과 약을 동일시한 우리 음식은 동물성 기름과 식물성 기름이 7:3의 가장 이상적인 비율을 이루는 건강하고 과학적인 음식이기에 오늘날 세계적인 위상에 오른 자랑스런 문화라는 점도 강조했다.
여행의 막바지에는 간장으로 만든 김치인 `장김치' 무를 쪄서 담근 부드러운 깍두기 `숙깍두기', 전복과 해삼, 잣이 들어간 최고급 김치 `감동젓무' 등 사라져가는 전통음식도 등장한다.
생각의 나무 펴냄 / 정혜경 지음 / 284쪽 /1만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