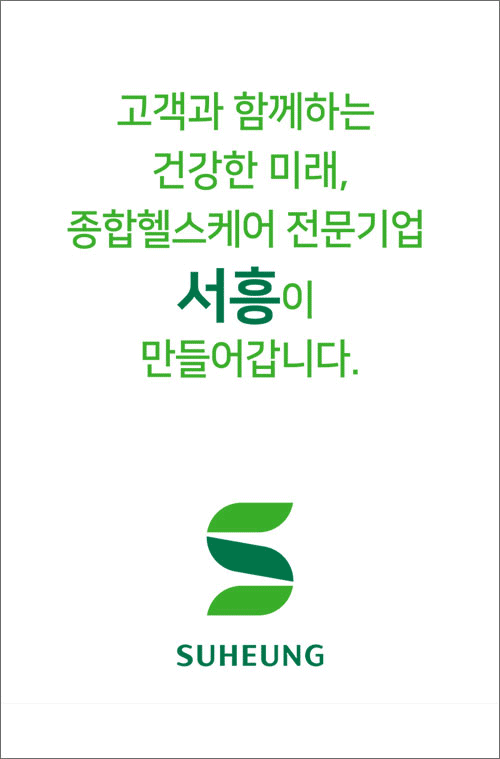충북 영동의 한 곶감건조장이 살균을 목적으로 유황을 태우다가 불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곶감건조과정의 유황훈증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일 영동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밤 10시 40분께 영동군 영동읍 한 곶감건조장에서 불이 나 약 100㎡의 건조시설과 말리던 곶감, 지게차 1대 등을 태워 57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 불은 건조장 주인이 감타래에 매단 곶감을 살균하기 위해 유황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곶감이 건조과정서 썩거나 곰팡이가 생겨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밀폐된 건조장 안에서 유황을 태우는 방식으로 훈증처리했다.
유황이 타면서 나오는 이산화황(아황산무수물.SO2)이 미생물 번식을 막아 부패를 방지하고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 산화를 막아 색이 검게 변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산화황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곶감 등 건조과실류(수분함량 40% 이하)의 이산화황 잔류기준을 2천ppm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식약청 청과물기준과 문기임 연구관은 "유황은 곶감의 산화를 막아 색깔이 검게 변하거나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만 천식환자 등에게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어 잔류기준을 정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지역 대규모 곶감 농가도 3~4년 전부터 유황 대신 주정(에탄올)을 사용한 살균방식을 도입해 현재 대부분의 농가에 보급된 상태다.
영동곶감생산자연합회 전정호 회장은 "TV 홈쇼핑이나 백화점 등에서 잔류농약과 이산화황 검사를 강화하면서 80~90% 이상 농가가 유황사용을 중단한 상태"라며 "다만 비싼 주정값에 부담을 느낀 일부 영세농가 등에서 일부 유황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유황 사용이 근절되지 않자 업계 안팎에서 '영동곶감'의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몇몇 대형업체를 제외하면 이산화황 잔류농도 검사 없이 납품이 이뤄지는 데다 지자체 차원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이산화황 잔류기준이 정해져 있을 뿐 유황 사용 자체를 강제로 막을 법이나 규정은 없다"며 "다만 전국 최고품질을 자랑하는 영동곶감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업계와 손잡고 자구노력을 벌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동곶감이 상품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6월 지리적표시등록된 만큼 이 표시 때 이산화황 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 감의 10%(도내 70%)를 생산하는 이 지역은 300여 농가가 한해 생산되는 4700t의 감 중 절반이 넘는 2500t(약 65만접)을 곶감으로 말려 200여억원의 수입을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