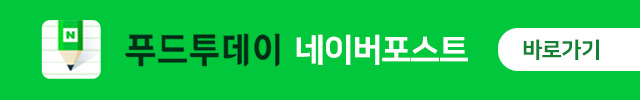[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전날의 과음으로 힘든 아침, 직장인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메뉴는 국밥이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들어가면 숙취가 풀리면서 해장술을 부른다. 소주잔을 부딪히며 먹기 좋은 국밥은 한국사람이라면 친숙한 서민 음식이다. 곰탕과 설렁탕, 콩나물, 소고기에 이르기까지 국밥재료의 범위는 넓다.
국밥은 국과 밥이 따로나오는 따로국밥과 밥에 국물을 부은 다음 그 국물을 따라내고 다시 국물을 붓기를 반복하는 '토렴'을 하는 국밥이 있다. 토렴을 통해 나온 국밥은 밥에 국물의 맛이 배어들고 밥이 말아져 있기 때문에 국물이 식지 않고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먹는 것으로 여겨졌던 설렁탕이 특유의 냄새와 푸짐함, 고소함 등을 무기로 일제강점기 내내 득세하면서 장국밥은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 해방 이후 물자가 풍족해지면서 경상도에서 유명했던 돼지국밥이나 전주에서 유명했던 콩나물국밥 등도 많이 인기를 끌면서 그 외 여러가지 다양한 국밥들이 다양한 변모를 걸쳐 현재까지 이른다.
일제강점기에는 설렁탕은 최초의 패스트푸드이자 외식메뉴 중 가장 저렴한 메뉴였다.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국밥은 친숙하지만 지식층에게는 인기가 없는 음식이었다.

조선시대의 농경 사회에서 자원으로 여겨졌던 소는 도축하면 중형에 처할 정도로 중요한 가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를 한 번 잡으면 고기 외에도 내장과 각종 부산물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음식으로 탄생시켰다. 소꼬리와 도가니 등의 부위와 소머리뼈까지 가마솥에 고아서 밥을 말아 낸 것이 소머리국밥의 시작이었다.
소머리 국밥은 경상도를 중심이 된 음식인데 경남의 소고기국밥은 소의 머리부속도 쓰지만 양지를 쓰기도 하고, 창녕군은 수구레를 넣은 국밥이 별미라고 한다. 수도권 중에서는 경기도 광주시의 곤지암읍이 소머리국밥으로 유명하다.

돼지 뼈로 우려낸 육수에 돼지고기와 밥을 넣는 돼지국밥은 부산에서 유명한 식사메뉴이다. 돼지국밥의 유래에는 다양한 설이 있지만 전쟁 중에 배고픈 피난민들이 그나마 쉽게 구할 수 있는 돼지의 부속물로 국을 끓여 나눠먹억으며 유래하였다는 설이 유력하다.
전라도 지방에서 유래된 콩나물국밥은 해장국으로도 불린다. 특히, 전주는 물이 맑아 콩나물이 유난히 맛있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유난히 콩나물국밥 전문점들이 많다. 동의보감에서 콩나물은 독성이 없고 맛이 달며 오장과 위장에 맺힘을 풀어준다고 기록돼 있기 때문에 숙취해소에 탁월하다.

사실, 국밥은 영양학적으로 봤을때 좋은 식습관은 아니다. 국물에 말아진 밥은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게 되어서 소화하는 빙해가 되며, 펄펄 끓는 높은 온도로 짠맛이 둔해져 염분섭취가 많아지기 때문에 나트륨과 탄수화물의 결정체이다.
하지만 오늘 저녁은 백석의 시 '나와 나타샤와 당나귀'처럼 눈이 펄펄 나린다. 작고 아늑한 불빛의 선술집에서 따뜻한 정종과 국물요리가 생각나기도 하지만 모두가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시국인만큼 투박한 국밥집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과 소주 잔을 기울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