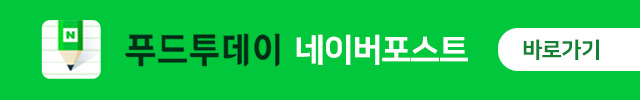[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비밀과 고민을 털어놓게 되는 마법의 '초록병' 소주는 그런 술이 아닐까? 기자 후배 한 명은 "선배, 어렸을때는 국밥집에서 소주 한 병 시켜놓고 반주하는 어른을 보면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세상 그렇게 진실하고 인간적인 사람이 없어요"라며 소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적이 있다.

병아리 기자시절, "낮에 소주를 즐기는 낮술 문화라는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선배 두세명과 시작된 낮술은 "소주 한 잔 하자"라는 선배의 호출에 달려온 기자와 취재원들이 점점 늘어나 가게를 채우고 밤까지 마신 신기한 경험을 하며 직업 관계없이 소주는 불호라는 진리를 알았다.
주당인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소주에 갖는 애정은 각별하다.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묻는 질문에 위스키나 와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외여행시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좋은 술이 있어도 굳이 팩소주와 플라스틱병의 소주를 여행가방에 챙기고 소주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야구장에서도 소주를 구입해 몰래 맥주잔에 타서 '소맥'을 즐긴다.

와인의 매력에 빠져서 서서히 가산을 탕진하고 있는 본인에게 선배들은 말한다. "어차피 와인,위스키로 이어져도 결국은 다시 소주로 돌아오게 돼있어"
고된 하루를 보낸 직장인의 하루를 달래주고 가성비 좋고 만만한 술, 소주는 어떻게 탄생됐을까? 우리가 흔히 마시는 희석식 소주의 기원은 1965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주린배를 채우기도 녹록치 않았던 시절이었던 1965년 주류 제조 금지 양곡관리법이 실시되면서 희석식 소주가 생산된다.

우리 조상들이 마셨단 소주는 증류식 소주로 부태우다 소(燒)에 술주(酒)로 즉 불로 증류시켜 만든 술이다. 오늘날 소주는 주정에 물과 김미료를 넣어 희석시킨 소주다. 기계를 이용해 95% 가량 되는 알코올 도수를 20~35%로 희석시키는 원리로 만들이진다.
1965년 당시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는 희석소주를 만드는 수백개의 제조업체가 난립했다. 주류 유통 질서가 문란해지자 정부는 1973년, 1도 1사의 원칙인 자도주법이 생겨나며 제조업체가 통합에 나섰다. 통상 30도였던 소주의 도수가 25도로 낮아지며 서민들의 삶을 파고든다.
그때부터 각 지방마다 대표소주가 등장했다. 서울.경기 지방은 진로, 대구.경북은 김복주, 경남은 무학이 탄생한다. 1981년 자도주 의무구입제 완화로 소주업체들의 경쟁은 치열했다.
1994년 지금의 지금의 롯데주류인 두산주류에서 깨끗한 이미지를 내세우며 초록병에 담은 '그린소주'를 출시한다. 반응은 폭팔적이었다. 1999년 당시 소주 업계 선두였던 '진로'를 넘어서 단일 브랜드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한다.

1996년, 자도주법이 폐지되고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소주의 수요량이 급증했다. 1998년 참이슬이 출시됐다. 참이슬은 23도라는 도수로 25도 였던 공식을 깼다. 당시에는 파격적인 시도였다. 또, 제조과정에서 대나무숲 여과공법을 도입해 소주 특유의 독한맛을 완화 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도 참이슬 광고에는 대나무 숲이 자주 등장한다.
2006년에는 참이슬의 라이벌 처음처럼이 출시된다. 처음처럼은 최초로 알칼리 화원수를 사용했고 알코올 도수를 20도 이하로 낮춰 여성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던가. 1994년 현 롯데주류인 두산이 '그린소주'로 지금의 하이트진로인 '진로'를 수성을 잡고 라이벌이 됐듯이 롯데주류와 하이트진로의 악연은 다시 재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