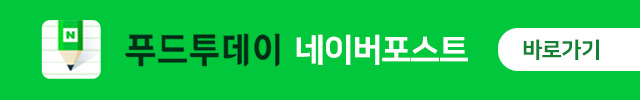[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19년, 달걀 껍데기에 숫자가 새겨지기 시작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정부는 계란 생산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난각표시제’를 도입했다. 달걀마다 산란일과 사육환경이 표시되며 소비자는 그 숫자를 통해 계란의 신선도와 생산방식을 추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제도는 여전히 여러 물음표에 직면해 있다. 불투명 케이스나 온라인 구매 시 소비자는 난각번호를 확인하기 어렵고, 고병원성 AI 특수 방역기간에는 자연방사 자체가 금지되며 ‘1번’ 계란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다. 농가 현장에서는 ‘사육환경 번호’가 실제 위생이나 품질과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연구에서는 자연방사 계란이 더 위생적이지 않다는 결과도 보고됐다.
난각번호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그 알 권리가 얼마나 실질적인지, 그리고 이 숫자가 진짜 ‘믿을 만한 기준’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시점이다. 이에 푸드투데이는 이번 기획을 통해 제도 시행 배경과 운영 현실, 농가·소비자·정부의 입장을 조망하며, 난각표시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1번 계란은 더 건강할까?”
껍데기 위 숫자에 담긴 신념…난각표시제 5년의 명암
동물복지, 방사 사육, 케이지 번호까지 계란 껍데기에 찍힌 숫자, 일명 '난각번호'는 이제 소비자에게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됐다. 그러나 실제 사육환경이 계란의 영양성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 문제나 가격 격차는 오히려 소비자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난각번호는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와 함께 사육환경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숫자는 1번부터 4번까지로, 각각 방사(1번), 평사(2번), 개선 케이지(3번), 기존 케이지(4번) 사육 방식을 의미한다.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동물복지 확대”를 내세웠다.
실제로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리뷰에는 “무조건 1번 계란만 삽니다”, “아이 먹는 거라 1번이 안심돼요” 등의 후기가 적지 않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직장인 박 모씨(39)는 “몸에 좋을 것 같고, 영양 성분이 젤 좋지 않을까 싶어 늘 1번 계란을 찾는다”고 말했다.
반면,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은 다른 입장이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주부 김 모씨(46)는 “계란은 어차피 익혀 먹는 거고, 비싼 1번보단 그냥 신선한 걸 고른다”며 “자주 먹는 식품인데, 가성비 좋은 걸 사게 된다”고 했다.

과학은 뭐라고 말할까?…“영양엔 차이 없다”
문제는 '사육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달걀에 매겨진 숫자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번호에 따라 영양 성분에도 차이가 있다고 믿지만 과학적 근거는 빈약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시동 소장은 “계란은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완전식품”이라며, “사육환경이 영양성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 주요 성분은 사육 방식과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덜 받은 계란?”…심리적 안심 효과는 존재
그렇다면 차이는 없을까? 윤진현 전남대 교수팀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주목했다. 다단식 평사(2번)와 케이지 환경(3번)에서 생산된 계란을 비교한 결과, 3번 계란의 노른자에서 스트레스 지표인 코르티코스테론 농도가 두 배 이상 높았다. 스트레스를 덜 받은 닭이 낳은 계란이 더 '심리적 안심'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위생 문제는 또 다른 논쟁 지점이다. 난각번호 1번 계란이 반드시 더 깨끗하다는 보장은 없다. 양계 업계 관계자는 “밖에서 낳는 알은 흙과 배설물에 더 쉽게 오염되고, 수거가 늦어질 경우 신선도에도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케이지 사육은 관리 효율성과 수거 속도 측면에서 오히려 위생 관리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선택은 결국 가격과 신념 사이에서 결정된다. 시장조사기관 엠브레인에 따르면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계란은 개당 평균 367원으로, 일반 계란(232원)보다 58% 비싸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지불해도 좋다’고 여기는 가격 차이는 평균 20% 수준에 그쳤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 즉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이상과 경제적 부담 간의 괴리가 여실히 드러나는 지점이다.
실제 소비자 박 모씨(42·인천)는 “좋은 건 알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 세 배 가까이 차이나면 현실적으로는 손이 안 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