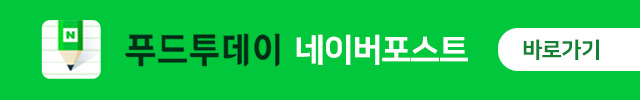[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안가는 이유는 뭘까? 대형마트에 비해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상품구성? 위생? 결제의 불편? 분명 저변이 그런 이유가 깔려 있긴 하겠지만 아마 이 영상이 가장 가까운 답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 전통시장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든 혼자햐님의 화제의 영상.
고객을 불편하게 만드는 서비스. 어느 한 상인의 고객접대 문제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 한명은 접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한 정부 진단은 상당히 단편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 본인들이 제어할 수 있고 생색을 낼 수 있는 선에서 결론을 찾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유통공룡’ 대형마트는 전통시장에 위협이 된다.”
그런 이유로 월2회 대형마트는 강제적으로 휴무일을 가져야 합니다. 그나마 평일이었던 의무 휴일을 손님이 가장 많은 공휴일 중 지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정부 여당에 의해 발의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 아예 모든 대형마트가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전통시장을 찾을까요?
도움은 되겠지만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룡’이라던 대형마트마저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업계에 밀려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머리 터지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통시장의 생존을 위해 자기 살기도 어려운 대형마트의 영업일을 강제하고, 소비쿠폰 등 각 종 지원책을 혈세를 들여 쏟아붇고 있는데 전통시장의 서비스는 후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대사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영화 부당거래 대사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줄 안다”
스마트폰의 등장에도 PC방이 살아남은 건,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만들어달라고 시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맛집’이 되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문화 공간’으로 스스로 변신했기 때문입니다.
PC방이 규제를 요구하는 대신 맛집으로 진화했듯, 시장도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진짜 위기는 대형마트의 존재가 아니라, 고객을 외면하는 서비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동정심만으로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보호’의 울타리를 넘어 ‘시장만의 경쟁력’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지원금보다 시급한 과제는, 소비자가 다시 시장을 찾아야 할 확실한 이유를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