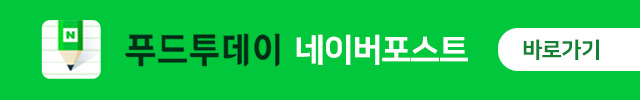[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과 의약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시각·청각장애인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았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와 식품업계가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변환 코드를 활용해 '정보 접근권' 강화를 위한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식품과 의약품처럼 일상 소비재 분야에서도 접근성 확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 정책: 식약처 주도 정보 접근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과 의약품 등에 점자 표시와 함께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는 제품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기된 QR코드, 바코드를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 정보를 음성 또는 수어 영상으로 변환해주는 전자적 표시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2023년 12월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식품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 코드 표기가 가능하도록 했고, 식품 포장 형태별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또한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고,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7월 21일부터는 일부 의약품·의약외품에도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코드 표시가 의무화됐다. 식약처는 올해 의약품·의약외품의 점자 표시 적합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의약외품 업체가 참고할 수 있는 음성·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장애 유형, 연령 등을 고려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표시 활용법과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장애인 시설 대상 맞춤형 교육도 진행 중이다.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기재사항에 점자 표시를 권장 하고, 기존 수어 체계에는 없는 의료기기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수어로 개발해 의료기기 안전 정보를 수어 영상자료로 제작할 계획이다. 올해 인슐린주입기, 혈당측정기 등 40개 의료기기를 선정하여 안전 정보에 대한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7월 2일부터 화장품에도 점자 외에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e-라벨 사업은 참여업체가 13곳으로 확대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제품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장 변화: 일상에 스며든 점자와 QR코드

생활 속에서도 점자와 음성 안내 기능을 갖춘 제품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은 '맥심 오리지날', '모카골드', '디카페인', '아라비카' 등 인스턴트 커피 4종 패키지에 '맥심 커피' 점자 문구를 삽입했다.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참이슬' 페트병, '테라', '켈리', '필라이트' 캔 제품에 각각 '소주', '맥주'를 점자 표기했다. 특히 '테라'는 국내 맥주 제품 중 유일하게 점자로 제품명을 표기했다.
오뚜기(대표 황성만)는 국내 소스류 최초로 '토마토 케챂'과 '골드 마요네스'에 점자 스티커를 부착했다. '컵누들’ 일부 제품에서 시작한 점자 표기는 오뚜기가 개발한 발포성 재질의 ‘스마트 그린컵’을 사용하는 용기면·컵면 전 제품 70종과 컵밥 35종, 용기죽 10종 등에도 점자 표기를 확대 적용해 접근성을 높였다.
삼양식품(대표 김정수, 김동찬)은 '불닭볶음면' 시리즈를 비롯한 주요 라면 제품에 점자 표기를 적용했다.
농심(대표 이병학)은 '신라면큰사발' 제품에 QR코드를 삽입해, 조리법과 소비기한 등의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제품을 손으로 만지거나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농아인협회 채태기 회장은 “식약처의 노력으로 식품과 의료제품 등에 점자나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가 확대되고 있어,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유경 처장은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다양한 제품에 점자 등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업계에서도 포장 변경 등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든 국민이 식품·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업체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직까지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제공은 일부 품목에 국한되며, 업계 자율적 참여에 의존하는 비율도 높다. 향후 저시력자, 고령 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 유형에 맞춘 맞춤형 정보 제공과 소비자 인식 개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앞으로 더 많은 제품과 공간으로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