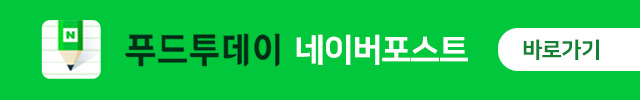[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이 다양한 가공식품 원료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은 이를 인식하거나 회피할 방법조차 없다. 현행 제도상 제조·가공 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사라지면 표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는 “GMO인지도 모른 채 섭취하고 있는 현실은 알권리 침해”라며, DNA 잔존 여부와 관계없는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국내 식품 시장에서 GMO 원료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이를 식별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식약처에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잔존하는 식품에만 GMO 표시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정제 과정에서 DNA가 사라진 GMO 옥수수 전분, 콩기름, 포도당 등에는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제도적 한계 속에서 국내 GMO 식품 수입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만3천톤 수준이던 수입량은 2024년 8월 기준 10만6천톤으로 약 9배 증가했다. 특히 과자·빵·조미식품 등 일상에서 자주 섭취하는 품목군에 GMO 원료가 집중돼 있다.
2023년 식약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소비자 78.5%가 ‘GMO 원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018년에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명 이상이 동의한 바 있다.
GMO 감자 국내 수입 추진, 표시 공백 우려 커져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미국 심플로트社의 유전자변형 감자(SPS-Y9, SPS-X17 등)에 대한 국내 수입 승인 심사가 진행되며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SPS-Y9, X17 품종은 농식품부와 환경부 등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SPS-E12는 2016년 심사 접수 이후 2025년까지 심사 지연 중이다. 해당 품종은 갈변을 막기 위해 멜라닌 생성 유전자를 제거했으나, 병균 감지 기능이 떨어져 독소 축적 우려가 제기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감자가 음식점에서 사용될 경우, 표시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즉, 소비자들은 감자튀김·조림 등 외식 메뉴 속 감자가 GMO인지 확인할 수 없는 구조다.
소비자단체 “GMO 완전표시제는 최소한의 선택권”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표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라며, “GMO DNA 잔존 여부에만 의존하는 현 제도는 시대 흐름과 맞지 않으며, GMO 완전표시제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GMO 표시제도 외에도 공공 및 학교급식에서의 GMO 원료 사용 금지, 소비자 접근 가능한 이력 관리 체계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