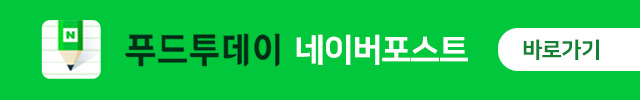[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올가홀푸드(대표 권순욱)와 초록마을(대표 김재연)은 국내 친환경·유기농 식품 유통의 상징이었다. 유기농 채소, 무항생제 축산물, 공정무역 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며 ‘안전한 밥상’을 원하는 소비자의 첫 선택지였다. 하지만 2025년 현재, 두 기업은 나란히 위기 국면에 서 있다.
올가홀푸드는 1981년 ‘풀무원 무공해 농산물 직판장’을 모태로 1997년 별도 법인으로 분리돼 프리미엄 유통을 개척했고, 초록마을은 1999년 설립 이후 전국 가맹망을 빠르게 넓히며 ‘안전한 먹거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다. 올가홀푸드는 수년째 이어진 적자 끝에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초록마을은 2022년 정육각에 인수된 지 3년 만에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친환경 맞수'의 잇단 퇴조는 단순히 경영 실패가 아니라 친환경 유통 모델 자체의 변화가 불러온 구조적 위기의 단면이다.
올가홀푸드, 40년 역사에도 불구한 만성 적자
올가홀푸드의 뿌리는 1981년 서울 압구정동에 문을 연 ‘풀무원농장 무공해 농산물 직판장’이다. 풀무원에서 1997년 분리 법인으로 독립해 유기농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화했다.
올가홀푸드의 성장기는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이었다. 2008년 이후 건강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매장 수가 빠르게 늘었고, 2011년에는 ‘바이 올가’를 론칭하며 공격적인 가맹사업에 나섰다. 그 결과 2015년에는 가맹점 100호를 돌파하고 매출 1,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경기 침체와 함께 친환경 인증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성장세가 꺾였다. 점포 유지 비용 부담까지 겹치며 수익성은 빠르게 악화됐고, 올가는 2005년 이후 매년 평균 20억 원대 손실을 기록하며 만성적자에 시달렸다.
가맹점은 전성기 100여 곳에서 2024년 8개로 쪼그라들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영업이익 9억 원, 2024년 순이익 52억 원을 기록하며 반짝 흑자를 냈지만 누적 결손금이 약 4,200억 원에 달해 현재까지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숍인숍, 온라인몰, O2O 전략 등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으나 쿠팡·컬리 등 이커머스 공세 앞에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초록마을, 정육각 인수 3년 만에 법정관리
초록마을은 대상홀딩스의 자회사로 지난 1999년 설립 이후 ‘안전한 먹거리’ 열풍을 타고 빠르게 성장했다. 전국 가맹망을 확대하며 유기농 전문 매장으로 입지를 다졌고, 한때 연 매출 2,300억 원을 돌파하며 국내 친환경 유통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한 2010년대 후반부터 매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이 ‘유기농·무항생제’를 전면에 내세운 프리미엄 카테고리를 강화하면서 초록마을의 차별성은 빠르게 희석됐다. 실제로 매출은 1,700억 원대 수준으로 줄었고,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난이 심화됐다.
2022년 스타트업 정육각에 인수되며 새 돌파구를 찾는 듯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정육각은 초록마을을 전국 매장 거점으로 삼아 ‘초신선 축산물’ 전략을 확장하려 했지만 투자 유치 실패와 고금리 부담 속에 재무구조가 급격히 흔들렸다.
결국 지난 7월, 초록마을은 정육각과 함께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같은 달 인가 전 M&A도 추진했지만 오아시스마켓과 더본코리아 등 거론된 인수 후보들은 “인수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협력사 피해도 크다. 초록마을의 미정산 채권액은 약 200억 원에 달해 협력업체와 가맹점의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회사는 법정관리 상태에서도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 운영을 유지하며 거래선 이탈을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매장 수는 289개(2025년 기준)로 2022년 대비 약 24% 줄었다. 회생 성공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두 기업이 겪는 위기의 본질은 소비 채널 전환이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소비자들은 올가홀푸드와 초록마을 매장을 직접 찾아 유기농·무항생제 식품을 구매했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서는 쿠팡, 컬리, 네이버 장보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클릭 한 번으로 같은 제품을 집 앞까지 받아볼 수 있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여기에 대형 유통사의 공세도 거세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앞다퉈 ‘친환경·프리미엄 식품’ 카테고리를 강화하면서 가격 경쟁력과 배송 편의성에서 전문 브랜드는 밀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친환경의 대중화 역설’이 나타났다. 과거에는 프리미엄 상징이었던 친환경이 이제는 대중적 기본 옵션으로 자리 잡으면서 올가와 초록마을의 차별화 가치는 약화되고 브랜드 정체성마저 희석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주부 A씨는 “딸이 어릴 때는 이유식을 만들기 위해 초록마을을 자주 이용했고, 친환경 축산물과 채소, 아이 간식까지 챙겨 샀다”며 “백화점에 갈 때는 올가 매장도 들렀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컬리나 쿠팡에서도 건강한 먹거리를 바로 배송받을 수 있어 굳이 친환경 전문점을 찾아갈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24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도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 식품 구입처는 전통적인 전문점과 대형 할인점에서 온라인과 생활권 소매점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대형 할인점 이용 비중은 2019년 41.2%에서 2024년 33.8%로 줄었고, 친환경 식품 전문점 역시 같은 기간 14.2%에서 9.1%로 하락했다. 반면 온라인 구매는 2.8%에서 10.9%로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도 13.8%에서 22.9%로 크게 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소비자들이 더 이상 ‘전문 매장’을 굳이 찾지 않고, 접근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채널을 통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올가홀푸드와 초록마을이 겪는 위기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소비 채널 변화라는 구조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가홀푸드와 초록마을은 국내 친환경·유기농 유통의 1세대를 열었지만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식품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플랫폼 전환과 데이터 기반 소비자 맞춤 전략이 뒤따르지 않는 기업은 버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