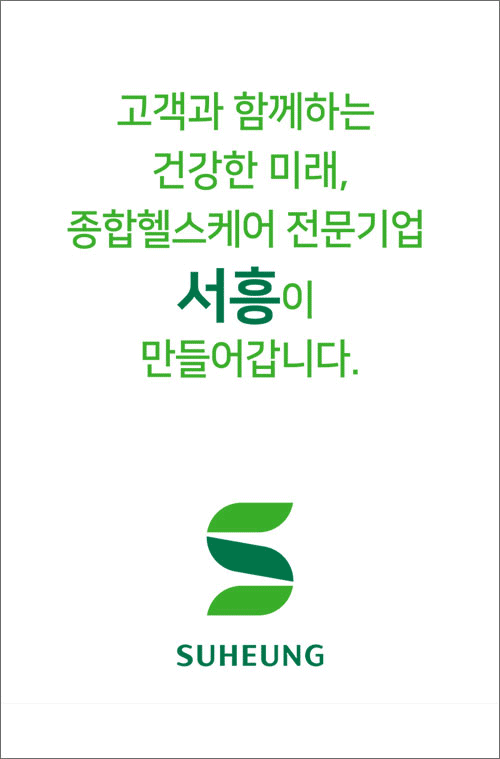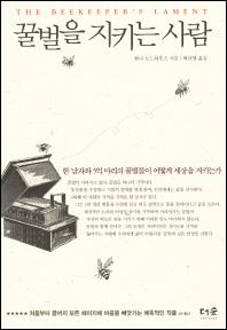 작고 보잘 것 없고 우연히 마주치면 모두 피하려 들지만 그의 운명에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곤충이 있다. 바로 꿀벌이다.
작고 보잘 것 없고 우연히 마주치면 모두 피하려 들지만 그의 운명에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곤충이 있다. 바로 꿀벌이다.
몇 년 전부터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인류의 불안한 내일에 대한 경종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전 세계 상업작물의 90% 정도의 꽃가루받이를 하고 있는 꿀벌이 사라지면 식량에 큰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꿀벌의 떼죽음 원인과 대책을 찾는 일에 각국이 매달리고 있다.
미국 저널리스트 한나 노드하우스가 쓴 '꿀벌을 지키는 사람'은 꿀벌의 떼죽음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거나 꿀벌을 떼죽음으로 내몬 인류의 몰지각을 꾸짖고 있는 책은 아니다.
단지 4대째 양봉업자로 살아온 존 밀러의 삶을 5년 동안 추적하며 써내려간 논픽션이다.
그러나 밀러와 그가 키우는 꿀벌의 이야기는 꿀벌을 매개로 인류가 생각해야 할 수많은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존 밀러는 1만 개의 벌통을 트럭에 싣고 미국 전역으로 꽃을 찾아다니고 꿀을 모으는 이주 양봉업자다.
단순히 벌을 기르고 꿀을 모아 돈을 버는 양봉가였던 그가 "생존의 기로에 선 위험에 처한 종을 지키는 관리자이자 대표"의 역할을 떠맡게 된 것은 2005년 2월부터.
그 겨울 밀러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1억5000만 마리의 벌을 잃었다. 밀러만 겪은 일은 아니었다.
'벌집 군집 붕괴현상(CCD. Colony Collapse Disorder)'이라는 이름까지 얻은 이 현상은 2006년과 2007년, 2008년까지 이어졌고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일부와 브라질을 거쳐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도 나타났다.
원인으로는 진드기 같은 기생충에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감염, 살충제, 집중사육 방식에 따른 영양실조, 이동통신 활성화에 따른 각종 전파의 영향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증거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그 원인이 인간에게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보인다.
"죽어가는 벌들은 우리가 환경에 저지른 죄악에 대한, 그리고 화학산업의 죄악에 대한 징벌의 징조다. 사람들은 벌에게 많은 의무를 지어주고, 벌들은 그 의무를 받아들인다. 마치 다른 모든 임무들을 받아들여왔던 것처럼 말이다."(231-232쪽)
인류의 미래에 대한 거창한 사명감이나 희소가치가 높아질 양봉업에 대한 발빠른 계산 때문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꿀벌에 대한 애정으로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밀러의 소박한 삶은 잔잔한 여운을 남긴다. 원제 'The beekeeper's lament'
더숲 펴냄 / 한나 노드하우스 지음 / 최선영 옮김 / 357쪽 / 1만4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