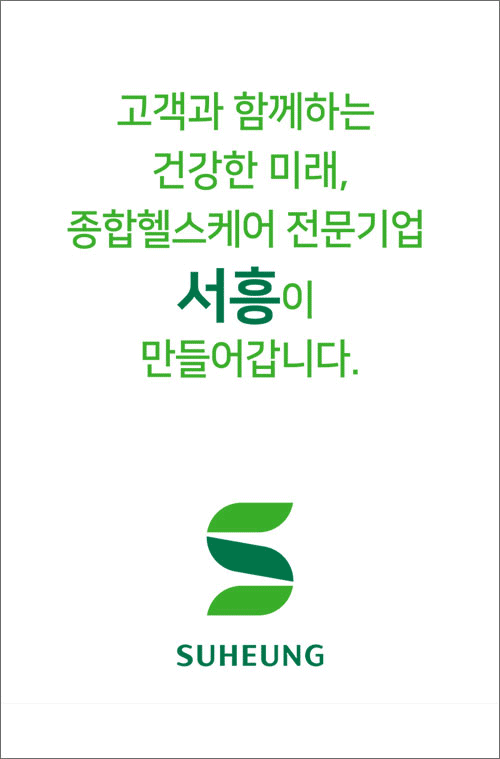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김상희 의원 '식품안전행정과 소비자 보호'토론회 개최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산업진흥과 안전규제를 일원화하는 것보다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부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주최로 열린 '식품안전행정과 소비자 보호'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소비자 중심의 관리체계를 오인하고 산업진흥과 안전규제기관의 일원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EU 국가들의 협력과 독립체계에 대한 오해, 소비자를 위해 더 강한 규제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기관들의 성격을 잘못 오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은 소비자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컨트롤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일본과 독일의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 스웨덴 소비자보호농업식품부 체계를 그 예로 들었다.
이 부장은 "행정부 소관 법률 대부분이 담당 영역의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법 성격이 강하지만 환경법, 노동법, 금융법 등은 산업육성과 산업규제의 정책으로 이원화돼 있다"며 "사회적 규제는 일반 경쟁 시장과 달라 이원화 체계로 진행한 것이므로 무리한 일원화는 안전규제의 특징인 소비자 안전의 약화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식품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 등이 진전되면서 값싸고 풍요로운 먹거리 환경이 됐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면서 다양한 식품사고가 출현하고 있다"면서 "식품은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침해가 직접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보다 리스크 규제의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은 '안심'을 포함한 '안전'의 개념 확장, 견제와 균형에 맞는 식품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그는 "식품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가 안심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과학적 근거를 이해 못하는 소비자가 문제라고만 치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안전은 과학에 근거한 것이지만 안심은 국민 개개인이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안전과 안심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규제 당국의 신뢰구축이 필요하다 것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준비로 산업과 소비자의 세력균형을 식품위생법에 담아내야 한다"며 "산업계와 소비자를 관리와 보호의 대상이 아닌 거버넌스의 대상으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유사한 취지를 가지는 규정들이 나눠 다수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경우가 많아 영업자 의무사항 규정들을 재검토하고 영업자가 발아들이기 명확하게 제시해 규제순응도를 재고해야 한다"면서 "산업계의 산업육상을 위한 규제철폐와 식품위생법 현대화 진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즉 식약처가 과학적 근거에 충실한 적절한 안전규제와 정보제공 등 규제과학에 입각한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는 또 "식품위생법상 소비자는 기존 후견적 소비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며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의무규정의 신설, 올바른 식품 소비에 대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은 1962년 제정 당시 영업자의 의무만을 규정했고 2017년 현재 34개의 의무규정과 10개의 권리규정이 명시돼 있다. 소비자의 의무규정은 2017년 현재 전혀 없고 권리규정은 6개 규정돼 있다.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소비자의 가장 좋은 수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부장은 "행정이 산업계를 규제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대는 지났고 행정의 중복규제 등의 완화가 적절하다"며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정책 결정 시 비용 편익의 현실화와 정책 결정에 소비자와 산업체의 강력한 참여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